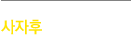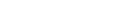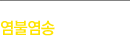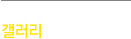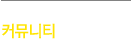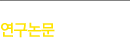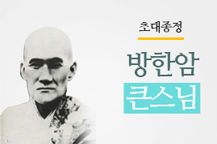교육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4 15:35 조회1,913회 댓글0건본문
우리나라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는 지난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문교부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됐다. 문화, 예술, 체육 업무까지 관장했다. 이후 1991년 교육부로,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로, 2008년 과학기술부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뀌었다가 2013년 다시 교육부로 개칭됐다.
정부 부처의 이름이야 시대 상황과 요구에 맞게 달라질 수 있지만, 문제는 한 나라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이리저리 합종연횡하면서 근간이 흔들렸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칭이다. 21세기 접어들면서 정보통신산업이 큰 관심을 끌게 됐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부처의 명칭은 물론 조직을 크게 확대했는데, 정작 놓친 게 하나 있는 것 같다.
이름 그대로 풀이하면, 학생을 자원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니 교사나 교수는 ‘자원을 발굴해서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데, 이는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게 소승의 생각이다.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선진국 가운데 교육을 인적자원을 발굴하는 방편으로 삼는 나라는 없다.
얼마 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학부모의 갑질로 인해 교사가 생을 스스로 마감해야 했고, 그로 인해 교사 수만 명이 거리로 나서는 일이 있었다.
학부모들은 ‘우리 집안의 귀한 인적자원을 위탁했으니 사회에 나가 돈 잘 벌고 지위 높은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발굴해 달라’는 마음이고, 교사들은 자의 반 타의 반 스승으로서 본래 역할을 잃은 채 발굴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빚어진 일이다. 신문을 봐도 그렇고 주변의 전언을 들어봐도 그렇고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모든 학교에서 크든 작든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
문제는 왜 이렇게 됐냐는 건데, 사실 몇십 년 전만 해도 스승은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였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했고, 담임이 가정방문을 오면 밭에서 일하다가도 부랴부랴 뛰어오곤 했다.
먼 조선 시대 고리짝 이야기도 아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이야기다. 역사로 보면 순식간에 지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한 사회의 기본 가치가 전도돼 버린 것이다. 혹자는 압축 고도성장의 폐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물질 만능 시대의 어두운 자화상이라고도 한다. 다 근거가 있는 말이다. 또, 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일도 아니다. 프랑스는 교육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로잡겠다며 얼마 전 올해 34세인 가브리엘 아탈을 교육부 장관에 앉혔다.
프랑스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더 절실하다. 아니, 절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해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의 성장을 이뤘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교육으로 망하게 생겼다는 걱정이 많다. 학교가 무너지면 사회도 함께 무너진다는 건 상식이다. 우리가 지닌 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우선하여 바로잡아야 할 게 교육인 까닭이다.
교권은 교사의 권위가 아니라 교사의 인권이다. 교권을 강화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인권을 낮추는 일도 아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교육선진국이라 불리는 독일에서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첫날 첫 시간에 담임교사가 신입생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한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자유입니다.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만은 해선 안 됩니다. 교사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항상 교사를 비판하는 사고를 기르도록 하세요.”
교권은 이렇게 세워지고 교사에 대한 존경도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우리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사들이 꼭 유념했으면 하는 말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