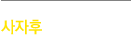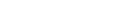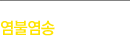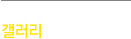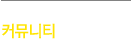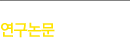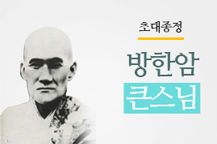법 이전에 도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3 13:53 조회1,986회 댓글0건본문
지난 7월 17일은 제헌절이었다. 1948년 7월 15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됐으니 어언 75년이 흘렀다. 아시다시피 헌법은 한 나라의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이다. 당연히 헌법이 없는 국가는 없다. 식민지 상태였던 나라들이 독립 후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이 헌법을 만드는 일이었다. 우리나라도 군정이 끝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가장 먼저 헌법을 제정했다. (대한민국 임시 헌법은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이다.)
법(法)이라는 한자를 파자(破字)하면 물 수(水) 변에 갈 거(去)로, 사회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맺힘이 없게 한다는 뜻이다. 인류 탄생 후 집단생활을 하면서 규율과 규범이 만들어졌다.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인데, 혼자 산다면 모를까 모여 살다 보면 당연히 욕망끼리 부딪치기 마련이다. 이 갈등을 조정하고 정리해 집단사회가 물 흐르듯 하게 만든 게 법이다.
하지만, 법이란 수많은 인간의 갈등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 갈등은 더욱 첨예화한다. 모든 법이 지속해서 개정되는 까닭이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정 이후 아홉 차례나 개정되었다. 시대가 달라지면 법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말이다. 그래서 법이란 시대정신을 담는 그릇이라는 표현도 있다.
그런데 법은 과연 만능인가? 따지고 보면 법은 최후의, 최소의 규범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법정에서 끊임없은 공방이 벌어지고 판결이 나와도 쉽게 승복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생기는 이유다. 또, 편법이 기승을 부린다.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기술자들을 당해낼 도리가 없다. 청문회를 보라. 어느 한 사람 명확하게 법을 어긴 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공직 후보자를 많이 봐왔다. 오죽하면 ‘국민 감정법’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을까.
법 이전에 도덕과 인륜이 우선해야 한다. 우리는 사법 만능의 시대를 살고 있다. 걸핏하면 법 앞으로 뛰어간다. 정치권이든 경제계든 일반 시민 사회든 어디를 막론하고 고소와 고발이 난무한다. 도덕과 인륜이 확립되지 않은 결과다.
법은 약한 자가 기대는 마지막 보루다. 한때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알려졌던, 기원전 1700년경의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법전은 정의와 공정한 판결과 약자 보호를 중요하게 여겼다. 무엇보다도 법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항을 강조했다. 3,700년 전의 법을 21세기 우리가 구현하지 못한다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도덕경》은 이렇게 말한다. “도(道)를 잃은 후 덕(德)이 나왔고, 덕(德)을 잃은 후 인(仁)이 나왔다. 인(仁)을 잃은 후 의(義)가 나왔고, 의(義)를 잃은 후 예(禮)가 나왔으며, 예(禮)를 잃은 후 법(法)이 나왔다.” 가장 나중에 나온 법에 기대기 이전에 도, 덕, 인, 의, 예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장자(莊子)가 《제물론(齊物論)》에서 말한 ‘존이불론(存而不論)’, 즉 ‘그냥 두고 논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 ‘법 없이도 산다’라고 변주할 수 있다. 무릇 법은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공기 같아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