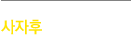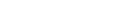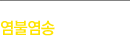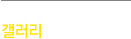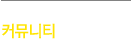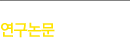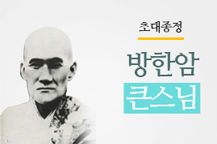[월정사 역사와문화] - 6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 관리자 작성일14-02-05 12:05 조회4,686회 댓글0건본문
Ⅱ. 고려시대; 화엄성지의
중건과 역사의 재인식
2. 민지(閔漬)의 1차사적기와 중건
월정사는 몽고
침입 이후 심한 곤란을 겪으면서 사찰이 쇠락해갔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기록이 그것을 보여준다.
병화(兵火)를 겪은 이래로 국가의 행보가 매우 어려워져서, 공양이 여러 차례 끊기고 절 또한 이미 심하게 기울어졌다. 사문이
한번 보고서 분개하고탄식하였다. 이윽고 부지런히 힘써 지붕을 수리하며 와서 나에게 말하였다.
“이 산의 이름이 천하에 널리 알려져 옛 것을 상고하는 곳입니다. 모두
신라 때의 향언(鄕言)인데,
사방의 군자가 능히 통견(通見)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비록 사인(使人)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능히 이 산의 영험함과 기이함을 연구하려고 하지만, 어찌 능히 얻을 수 있겠습니가? 만약 훗날 혹시라도 임금의 사자[天使]가 이 산에 도착하여 옛 기록을 보고자 한다면, 장차 어찌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까? 바라건대 글을 그 향언에서 바꾸어, 관찰하는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대성(大聖)의 영험하고 기이한 성적을 분명히알게
해주십시오.”
마치 해와 달처럼 확연하니 내가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여겼다. 비록
스스로 안 것으로 글을 지었지만, 그 뜻을 모두 드러낼 수 없었고 또 그 실상을 어길까 조심하였다. 붓을 꺾는다.
대덕(大德) 11년(1307) 2월 모일
선수조열대부(宣授祖列大夫) 한림직학사(翰林直學士) 광정대부(匡靖大夫) 자의도첨의사사(咨議都僉議使司) 연영전대사학제수(延英殿大司學提修) 사판문한서사(史判文翰署事) 민지가 기록하다.
<민지(閔漬), 「월정사 1차 사적기 발문」(『오대산사적』; 『조선불교통사』 하편1)>
민지(閔漬)의 「월정사 1차 사적기 발문」의 기록이다. 1307년의 기록이므로, 여기에서 병화란 몽고의 침입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병화(兵火) 이후에는 국가의 형편이 어려워져서 공양이 여러 차례 끊기고 절 또한 이미
심하게 기울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에서는 대략적으로 몇가지를 유추할 수 있다.
하나는 몽고의 침입이 있기 전까지는 월정사를 비롯한 오대산의 사세가 안정적이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몽고의 침입을 계기로 국가 차원에서 제공되던 자금들이 안정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양이 끊길 정도이고, 절이 심하게 쇠락하였다는 언급이 그것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있는데, 몽고의 침입에 즈음하여 고려의
선문이 급속하게 조계종 중심으로 재통합되었다는 점이다. 곧 조계종으로 통합되어 가던 불교계 내부의 형세와
전란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파탄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민지와 친분이 있는 승려이겠지만, 전란이 어느 정도 극복된
시점인 14세기 초에 월정사의 중창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지는
지붕을 수리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실 월정사의 1차 사적기는 이 월정사의 중창을 시도했던 승려의 청을받은
민지가 사적기를 향언에서 한문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것은 고려 후기에 접어들면서 신라
중대 이후 향언으로 기록되었던많은 문헌들이 한문으로 바꾸어서 기록되던 시대 조류와도 관계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향언으로 기록된 문헌기록들을 한문으로 바꾸어 중앙의 식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찰 중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도 역시 존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도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월정사시장경비(月精寺施藏經碑)」의 존재가 그 방증의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이 비는 1339년(충숙왕
복위 8) 절에 대장경을 시주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웠으나,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다만 조선후기에 이우(李俁)가 편찬한 『대동금석서(大東金石書)』에 탁본의
단편만이 수록되어 있다. 『대동금석서』에 는 이제현(李濟賢, 1287∼1367)이 비문을 짓고 종고(宗古)스님이 글씨를 썼다고 명기하고 있지만 현재 볼 수 있는 탁본 일부만으로는 이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
중궁(中宮, 왕비)께서
깨끗한 백금을 하사하였고 또 철(輟)…(결락)
/ 中宮賜潔白金且輟
명령이 있었다. 명(銘)에 이르기를,…(결락) / 有命焉銘曰
신독(身毒, 인도)의 글에 경전이 있고…(결락) / 身毒之書 有經
이익 되는
문이 크니, 이에 마음을…(결락) / 允也利門 乃心
다섯 봉우리 큰 산 가운데에 만수(曼殊)…(결락) / 五峯嶽心 曼殊
[음기]
소생이 모두 3명인데, 각기
부리게 하고, 밭 70…(결락) / 所生幷三名供其使令田七十
신안군 이안수가
듣고서…(결락) / 信安公李公安壽以聞백금
두 덩어리를 (시납하고) 다시
봉록을 시납하였다. 해마다…(결락) / 白金二鋋
又入廩祿歲
대중을 모으니 5천을 헤아렸다. 기묘년의
모임에…(결락) / 會衆\五千指 己卯之會재상의
김씨 부인과 신안 이공 …(결락)
/ 相國金夫人洎信安李
(『한국금석전문』 중세 하(下), 1984)
이제현은 고려 후기의 학자이자 문신이었는데, 문집인 『익재난고(益齋亂藁)』에도 이 비문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음기에는
신안군(信安君) 이안수(李安壽)가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그의 자세한 행적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최해(崔瀣, 1287∼1340)가 지은 「영주이지은소승위현비(永州利旨銀所陞爲縣碑)」의 내용 중에 원나라 궁궐에서 환관으로 근무한 이방수(李邦修)라는인물이 고려에서 신안군(信安君)으로 봉해진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가 이안수와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요약하면 1339년 월정사에 대장경을 봉안하는데 왕비가 백금을 하사
하였고, 원나라에서 환관을 지냈던 신안군 이방수도 백금 두 덩어리를 시주하였으며 당시 재상의 부인 김씨
등도 여기에 동참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고려 중기 월정사에는 대장경을 봉안한 전각이 있었음을 짐작할수 있다. 또한
대장경을 봉안할 정도라면 여타의 전각은 물론 팔각구층석탑과 함께 상당한 규모의 가람을 이루고 있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대장경의 봉안법회[己卯之會]에 5천 명의 대중이 모였다는[會衆五千指] 사실에서도 정사의 사세를 짐작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