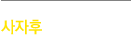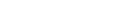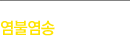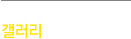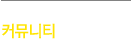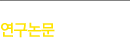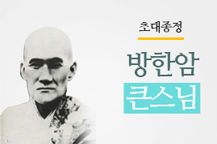[월정사 역사와문화] - 5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 관리자 작성일14-02-05 11:23 조회4,816회 댓글0건본문
Ⅱ. 고려시대; 화엄성지의
중건과 역사의 재인식
1. 고려 초기; 굴산문과
오대산 월정사
고려전기에 접어들 즈음 월정사는 창건 이래 최대의 흥성기를 맞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병화(兵火)를 겪으면서 절의
사세는 크게 기울어졌고, 다시 한 번 중건될 때까지 적지않은 간난의 역사를 견뎌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고려시대 월정사의 역사를 고려 초기 외연의 확대, 병화(兵火)와 중건의 과정, 고려 말의 재인식이라는
순서로 기술한다.
먼저 다루게 되는 것은 월정사 대가람의 형성과정에 대한 것이다. 월정사는
처음부터 대가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고려 초 굴산문의 세력을 크게확장하는 과정에서 오대산 화엄성지까지
그 세력권에 포함되었던 것으로보이며, 월정사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오대산 화엄성지의 중심 가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곧 고려 초 월정사 대가람의 형성은 구산선문 중 굴산문의 사상과 신앙이
기존에 있던 오대산 화엄신앙과결합해가는 과정으로 파악된다.
그 후 오대산과 월정사는 안정적인 사세를 유지하였으나, 몽고의 침입
이후에 사세가 심하게 기울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민지의 1차사적기는
그렇게 퇴락했던 사세를 재건하는 과정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고려 말 나옹과 오대산의 인연은 오대산이 다시 한 번 한국불교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특히 나옹의 문도들이 대거 오대산과 인연을 맺으면서 오대산 불교는 고려 말 조선 초에 이르는 동안 새로운 불교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 고려 초기; 굴산문과
오대산 월정사
이 월정사(月精寺)는 처음에 자장법사가 모옥을 지었으며, 그 다음에는 신효거사(信孝居士)가 와서 살았고, 그 다음에는 범일(梵日)의 제자인 신의두타(信義頭陀)가 와서 암자를 세우고 살았으며 뒤에 또 수다사(水多寺) 장로(長老) 유연(有緣)이 와서 살았다. 이로부터 점점 큰 절을 이루었다. 절의 다섯성중(聖衆)과 9층으로 된 석탑(石塔)은 모두 성자(聖}者)의 자취이다.
<『삼국유사(三國遺事)』, 「대산월정사오류성중(臺山月精寺五類聖眾)」>
거사가 죽은 이후 신의두타(信義頭陀)가 계승하여 중창하였는데, 의공(義公)즉 범일국사의 10명의 성스러운 제자 가운데 하나이다. (절의 기운이) 다 된 이후에 해가 지날수록 황폐해지니, 수다사(水多寺) 장로 유연(有緣)이 다시 세워 주석하였다. 유연
역시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다.
<민지(閔漬), 「효신거사친견오류성중사적(孝信居士親見五類聖衆事跡)」>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것인데, 일연의 기록보다는 민지의 기록이 시대상으로는
좀더 뒤떨어진다. 일연의 기록만 보면, 월정사의 사세 확장은
자장, 신효거사, 신의두타,
수다사(水多寺) 장로(長老)인 유연(有緣)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민지의 기록 역시 그 4인에 의해서 월정사의 사세가 확장되어 갔다고 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수다사
유연 장로의 기록 부분이 일연의 기록과 차이가 있다. 곧 “(절의
기운이) 다 된 이후에해가 지날수록 황폐해지니, 수다사(水多寺) 장로 유연(有緣)이 다시 세워 주석하였다. 유연 역시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신의두타가 주석하다 입적한 후에 월정사의 사세가 쇠퇴하였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이 기록을 주목하는 이유는 민지의 기록들이 많은 부분 일연의 기록과 유사하면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다. 곧 민지의 기록들은 병화로 쇠퇴했던 월정사를 중건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월정사의 성쇠에 훨씬 더
민감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중건의 역사를 지켜본 민지의 입장에서는 이전에 쇠락하였다가 다시 사세를 확장했던
역사에 더 관심을 기울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신의두타 이후 쇠락하였던 사찰을 유연장로가 다시 세워 주석하였다는
민지의 기록은 그래서 주목할 만한 것이다.
게다가 유연은 자장이 창건하였던 수다사의 장로였다. 수다사는 오늘날의
등명 낙가사의 옛 이름이다. 현재는 월정사의 말사이다. 이미
앞에서언급한 것처럼 자장(慈藏)이 창건하였는데, 당시 강릉 지역은 북쪽의 고구려와 동쪽의 왜구가 자주 침범하던 곳이었고, 자장은
부처님의 힘으로이를 막기 위하여 부처님의 사리를 석탑 3기에 모시고 이 절을 세웠다고 한다. 석탑 3기 중 1기는
현존하는 오층석탑이고 1기는 1950년 6•25전쟁때 없어졌으며 나머지 1기는 절 앞바다 속에 수중탑(水中塔)으로 세워졌다고 전해지는 유서 깊은 사찰이다. 신라 말 전쟁으로 불에 탄 것을 고려 초에 중창하고 절 이름을 등명사(燈明寺)로 고쳤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따르면, 강릉부 동쪽 30리에 있었고 절의 위치가 어두운 방 가운데 있는
등불과 같은 곳이라 하여 이름을 바꿨다고 한다. 또 이곳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삼경(三更)에 등산하여 불을 밝히고 기도하면 빨리 급제한다고 해서 붙였다고도 한다. 고려 때에는 매우 큰 사찰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조선중기에 폐사되었다.
그런데 수다사의 소재지는 강릉 정동진으로, 아마도 신라 하대에서 고려
전기에 이르는 시기에는 확실히 굴산사의 영향력 아래 있었을 것으로보인다. 굴산문은 개산 초기부터 범일의
노력에 의해 그 영향력을 낙산사까지 확대하고 있었으므로, 명주 지역 일대는 거의 굴산문의 영향 아래
있었을 것이다. 낙산사까지 굴산문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록에서 알 수 있다.
그 뒤에 굴산조사(崛山祖師) 범일(梵日)이 태화(太和) 연간(827∼835)에 당나라에 들어가 명주(明州) 개국사(開國寺)에 이르니 한 승려가 왼쪽 귀가 없어진 채 여러 승려들의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조사에게 말한다.
“나도 또한 한 고향 사람으로, 내 집은 명주(溟州)의 경계인 익령현(翼嶺縣)덕기방(德耆坊)에 있습니다. 조사께서 다음날 본국(本國)에 돌아가시거든
모름지기 내 집을 지어주셔야 합니다.”
이윽고 조사(祖師)는 총석(叢席)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염관(鹽}官)에게서 법을 얻고(이 일은 모두 본전本傳에 자세히 있다) 회창(會昌) 7년 정묘(丁卯; 847)에 본국으로 돌아오자 먼저 굴산사(崛山寺)를 세우고 불교를 전했다.
대중(大中) 12년 무인(戊寅; 858) 2월 보름 밤 꿈에, 전에
보았던 승려가 창문 밑에 와서 말한다.
“옛날에 명주(明州) 개국사(開國寺)에서 조사와 함께 약속을 하여 이미 승낙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늦는 것입니까.”
조사는 놀라 꿈에서 깨자 사람 수십 명을 데리고 익령(翼嶺) 경계에 가서 그가 사는 곳을 찾았다. 한 여인이 낙산(洛山) 아래 마을에 살고 있으므로 그이름을 물으니 덕기(德耆)라고 한다. 그 여인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나이겨우 8세로 항상 마을 남쪽 돌다리 가에 나가 놀았다. 그는
어머니께 말한다.
“나와 같이 노는 아이들 중에 금빛이 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조사에게 말했다. 조사는 놀라고 기뻐하여 그 아이와함께
놀았다는 다리 밑에 가서 찾아보니 물 속에 돌부처 하나가 있는데 꺼내 보니 한쪽 귀가 없어진 것이 전에 보았던 승려와 같았다. 이것은 곧 정취보살(正趣菩薩)의 불상(佛像)이었다. 이에 간자(簡子)를 만들어 절을 지을곳을 점쳤더니 낙산(洛山) 위가 제일 좋다고 하므로 여기에 불전(佛殿) 3간을 지어 그 불상을 모셨다(고본古本에는 범일梵日의 일이 앞에 있고, 의상義湘과 원효元曉의 일은 뒤에 있다. 그러나 상고해 보건대, 의상義湘과 원효曉 두 법사法師의 일은 당唐나라 고종高宗 때에 있었고, 범일梵日의 일은
회창會昌 후에 있었다. 그러니 연대年代가 서로 120여 년이나 차이가 난다. 그런 때문에 지금은 앞뒤를 바꾸어서
책을 꾸몄다. 혹은 범일梵日이 의상義湘의 문인門人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
<『삼국유사』 「낙산이대성관음정취조신(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조>이 기록에서
볼 때 명주 일대 전역이 굴산문의 세력범위에 속했다면, 아마도 수다사 역시 그러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다사 장로유연 역시 굴산문 출신의 승려였을 가능성이 크고, 굴산문 윗대의 인연을좇아서 쇠락한 월정사의 중건불사를 시작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선다음의 기록을 살펴보자.
『세기(細記)』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대산은 부처님의 성스러운 진신이 상주하는 곳이다. 월정사는 오류대성이
나타난 자취가 있는 땅이니, 하물며 이 절 또한 이 산의 후물(喉昒, 중요한 곳)인지라. 우리
태조가 왕업을 널리 열어 옛 성인의 가르침에 따라 매년봄과 가을에 각기 백미 2백 석, 소금 5십 석을 주어 특별히 수행함을 공양하고 복리의 자금으로 쓰게
하였다. 드디어 역대 임금들이 항규(恒規)로 삼았다.”
<민지(閔漬), 「효신거사친견오류성중사적(孝信居士親見五類聖衆事跡)」>
이것은 민지가 「효신거사친견오류성중사적(孝信居士親見五類聖衆事跡)」말미에 부기한 내용이다. 고려 태조가 절의 유지를 위해서 매년 봄과
가을에 각각 백미 2백 석과 소금 5십 석을 자금으로 쓰게끔
하였다는 것이다. 사세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이 태조의 후원으로 마련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고려 태조는 고려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여러 산문 세력들을 포섭함으로써 삼국 통일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건국후에도 지방 세력의 안정을 위해 주력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정책이 결혼정책과 각 지방을 대표하는 불교세력의 포섭이었다. 기록의
내용으로 볼때 굴산문 역시 그러한 범주의 대상에 속했을 것이다. 곧 굴산문은 고려초 태조의 후원을 통해서
세력을 크게 확장하였고, 그 초점이 월정사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정할 수 있다. 월정사는 신의두타와의 인연에 의해서굴산문이 오대산으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고리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장이 창건한 강릉 수다사(水多寺)의 장로로서 한편으로는 자장의 법손을 주장할 수 있었던 유연이 굴산문의 후원을 받으면서 자장이 터를 닦고 신의두타가
주석하였던 월정사에 들어와 중창하게 되면서, 마침내 월정사는 오대산 전체의 중심도량으로 면모를 일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지의 「효신거사친견오류성중사적(孝信居士親見五類聖衆事跡)」은 그 과정에서 오대산 신앙의 중심도량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인 동시에 유연장로에 의해 굴산문이 오대산의 중심
세력으로 등장하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인 것이다. 그리고 이때가 월정사의 사세가 한창 성장하고 확장되던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증의 하나가 바로 월정사 8각9층석탑이다. 월정사 8각9층석탑은
시기적으로 그 하한을 10세기 말 이전으로 보는 것 같다. 추정이긴
하지만 만약 8각9층 석탑이 10세기의 한 세기 동안 세워졌다면, 태조의 후원을 받은 시기 이후라고
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고려의 삼한일통 이후(936) 10세기
말 이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좀더 가능성이 큰 것은 일연의
“절의 다섯 성중(聖衆)과 9층으로
된 석탑(石塔)은 모두 성자(聖者)의 자취이다.”라는 기록을 고려할 때, 수다사 유연 장로가 월정사를 중건했던 때가 가장 유력한 시기들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더욱이 민지의 기록에 의하면, 태조 이래 월정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고려의 역대 임금들이 항규로 삼은 바라고 하였으므로, 적어도 몽고의 침입으로 인한 병화(兵火)가 있기 전까지 월정사는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되던 시기의 오대산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오대산문수사석탑기」가 있다.
뜰 가에 있는 석탑(石塔)은 대개 신라
사람이 세운 것이다. 만든 제도가 비록 순박하여 교묘하지는 못하지만 자못 영험이 있어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사실을 여러 옛 노인에게서 들었는데 이러하다.
“옛날에 연곡현(連谷縣)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탑 하나가 배를 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그림자를 보자 물속 고기들이 모두 흩어져 달아났다. 이 때문에
어부(漁夫)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여 그림자를 따라서 찾아가니
이 탑이었다. 이에 도끼를 들어 그 탑을 쳐부수고 갔는데, 지금
이 탑의 네 귀퉁이가 모두 떨어진 것은 이러한 까닭이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탄식해 마지않았다. 하지만 그 탑의 위치가 조금 동쪽으로 당겨져서 중앙에 있지 않은 것을 괴상히 여겨서 현판 하나를 쳐다보니 거기에는
이렇게 씌어 있다.
“비구(比丘) 처현(處玄)이 일찍이 이 절에 있으면서 탑을 뜰 가운데로 옮겼더니 그 후 30여
년 동안 잠잠히 아무런 영험도 없었다. 일자(日者)가 터를 구하려고 여기에 와서 탄식하기를 ‘이 뜰 가운데는 탑을 세울
곳이 아닌데 어찌해서 동쪽으로 옮기지 않는가’ 했다. 이에
여러 승려들이 깨닫고 다시 옛 자리로 옮겼으니,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나는 괴이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부처의 위신력(威神力)이 그자취를 나타내어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같이 빠른 것을 보고서, 어찌
불자(佛子)가 된 사람으로서 잠자코 말하지 않을 수 있으랴. 정륭(正豊) 원년 병자(丙子; 1156) 10월 모일에 백운자(白雲子)는 쓰다.
<『삼국유사(三國遺事)』, 「탑상(塔像)」제4,
「오대산 문수사의 석탑기」>
12세기 중엽에 문수사(상원사)를 방문하였던 백운자의 견문기이다. 기록 에서는 문수사의 석탑의 위치와
위치를 정한 관련 기록을 옮겨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엄격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 듯한 인상을 보여준다. 아마도 이 시기의 문수사는 오대산 신앙의 중심을 점하는 위치는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반면에 월정사를 중심으로 하는 오대산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록이 아닐까 생각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