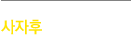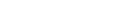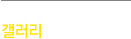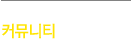탄허(呑虛) 택성(宅成)의 서예미학(書藝美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 관리자 작성일14-01-17 13:44 조회5,905회 댓글0건본문
탄허(呑虛) 택성(宅成)의 서예미학(書藝美學)
ㅡ 예술가(예술가)로서 탄허(呑虛) ㅡ
Ⅰ. 문제제기
본고의 논제는 ‘예술가(藝術家)로서 탄허(呑虛)’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탄허(呑虛) 택성(宅成, 1913-1983)은 정작 예술가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은 탄허가 ‘선승(禪僧)’일지라도 ‘서예가(書藝家)’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 또 선필(禪筆)이라서 감히 속세의 글씨잣대로는 탄허를 잴 수 없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탄허가 예술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유나 속내는 딴 데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바로 ‘서예(書藝)’가 ‘미술(美術)’이 아니고 그래서 ‘예술(藝術)’도 아니라고 한 시대에 탄허가 살았기 때문에 ‘선장선묵가(禪匠禪墨家)’인 탄허가 ‘예술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다.
역으로 탄허가 예술가라 한다면 탄허 예술의 전부인 서예(書藝)가 예술이어야 한다. 따라서 예술가로서 탄허를 서예를 통해 증명하자면 그 전제조건으로 서예가 왜 예술이고 또 예술 그 이상인지를 먼저 논증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내해야 한다.
이 일은 서화(書畵)가 하나로 놀던 전통시대는 물론 미술(美術)에서 그 예가 떨어져 나간 근 현대의 글씨사정을 감안하면 더욱더 중요해진다. 그리고 앞으로도 서예가 왜 동서(東西)를 넘어 모든 문자문명권(文字文名圈)을 아우르는 미래 예술이 될 수 있는지를 밝혀내는 일이기도 하다.
탄허시대 한국은 식민지(植民地)와 서구화(西歐化)로 요약되는 20세기 근 현대이다. 이 시기를 본고 논제의 핵심단어인 서예에 국한해서만 말한다면 미술에서 서예가 공식적으로 제외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사건이된다. 그 결과 서예는 근 100년간 서숙(書塾)과 공모전(公募展)을 전전하며 연명하였다. 그리고 이런 사적(私的)인 메카니즘 속에서 등장한 프로내지는 직업(職業)작가인 서예가(書藝家)들에 의해 한국의 근 현대 서단은 독점적(獨占的)으로 운영되고 장악되었다. 그 결과는 응당 서예가의 글씨가 아니면 서예(書藝)가 아닌 시대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선(朝鮮)과 같은 전통시대 서예를 실천하고 지탱해왔던 아마추어였지만 프로를 능가하는 문인(文人)사대부(士大夫)들이 글씨무대에서 사라지면서 서예는 학예일치(學藝一致)에서 학문과 예술의 분리시대로 진입하였다. 급기야는 동아시아 한자문화권(漢子文化圈)의 독자적(獨自的)인 예술이라고 자부가 무색하게 서예는 서구미술을 곁눈질하면서 정신(精神)에서 기법(技法)이나 조형(造形)중심으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한 때 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서예의 변질 내지는 변신은 ‘한글전용’ 즉 ‘한자문맹(漢子文盲)’이 가속화되면서 자의든 타의든 좋든 나쁘든 거역할 수 없는 실존의 문제로 우리 앞에 던져져 있다.
이런 와중에 유가(儒家)의 문인사대부가 주도한 조선에서도 희귀했고 직업서가들이 서단의 주도권을 장악한 근 현대는 더욱 보기 어려워 선 직업서가들이 서단의 주도권을 장악한 근 현대는 더욱 보기 어려워진 선필(禪筆)은 서숙과 공모전이 움직이는 주류서단에 명함조차 내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지금에나 와서 말하지만 서예가(書藝家)가 아니면 글씨도 아닌 듯한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선필은 굳이 붓을 내밀 필요도 없었거니와 설사 내밀어도 공모전잣대로는 정당한 평가초자 난망한 때 였다.
좌우지간 이런 서예를 둘러싼 시대와 사회분위기 속에서 선(禪)자체도 어려운데 선과 글씨 하나로 문제 삼는 선필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하는 조바심은 그래서 당연하다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더더욱 붓의‘쓰기’가 아니라 키보드의 ‘치키’로 일상문자생활이 대체되면서 도래한 ‘서예문맹(書藝文盲)’ 시대 한가운데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 탄허의 서예미학은 갑절이나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하다.
탄허를 온전한 서예가로 또 예술가로서 복원 하는데 에는 이와같이 탄허 예술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듯한 이런 사회적인 변화나 전제조건을 이해하고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다움에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탄허 글씨의 조형분석과 이를 동해 미학적인 아름다움과 정신경계까지를 밝혀내야 선승만이 아니라 선장선묵가로서 예술가로서 탄허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탄허의 글씨가 동시대는 물론 서예역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 작가와 비교해본다면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탄허를 볼 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서예가 예술인지 아닌지와 선필이 보통 서예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본 다음 탄허 서의 조형분석과 이를 통해 탄허의 미의식과 정신경계를 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서예역사에서 탄허 서예가 차지하는 비중과 성격을 보고자 한다.
Ⅱ. 20세기 근현대 서예와 미술
Ⅱ-1. 탄허시대 서예사정:서예(書藝)는 미술(美術)이 아니다.
흔히 20세기 한국의 근현대 100년은 망국(亡國)을 넘어 남북분단(南北分斷)의 현실 속에서도 단군(檀君)이래 최대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 시대라 한다. 백번 옳은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한 입장이나 장르에 따라서는 여전히 박탈(剝奪)이고 상실(喪失)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적어도 서예에 관한 ‘세상만사가 변(變)한다’는 엄연한 실존을 인정하더라도 번영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이러한 감정이 상대적으로 강도가 더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할까 만은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식민지(植民地)잔재와 서구화(西歐化)과정에서 입은 트라우마(trauma)에 있다. 하지만 이 보다 더한 상실감은 그간의 정신적 외상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것을 스스럼없이 버린 다는 데에 있다. 그래서 붓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 번영이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번영 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서예는 사실 서구제국주의(西歐帝國主義)세력을 등에 업은 일본이 조선을 침탈하면서 가장 먼저 버려진 것 중 하나다. 1882년 서양화가(西洋畵家) 고야마쇼타로(小山正太郎)는 ‘서(書)’를 경멸한 나머지 ‘서(書)는 미술(美術)이 아니다’고 외쳤다. 이것은 근대일본의 문화사 가운데 예술개념의 확립을 처음으로 촉발시킨 논쟁이었다. 사실 “일본에서 처음 미술(美術)이라는 번역어는 지금의 ‘예술(藝術)’을 지칭하는 번역어로 성립된 것이었으나 1876년에 설립된 공부미술학교(공부미술학교)에 초빙된 안토니오 폰타네시와 빈센조 라구사등 이탈리아 교사들이 회화와 조각을 가르친 결과 음악과 문학을 배제한 회화의 조각만을 ‘미술학교’에서 교육하면서 지금의 미술의 의미로 축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바로 식민지 조선의 ‘미술’개념으로도 이식되었고, 그 결과 더군다나 동양의 서예(書藝)에 대해서는 예술적인 개념조차 없었던 서구의 미술기준에서 볼 때 서화(書畵)는 더 이상 일치(一致)도 동원(同原)도 아니게 된 것이다. 고야마 쇼타로는 서예가 미술이 아닌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서(書)는 도화 조각 등과 같이 인심(人心)을 즐겁게 하려고 백방의 궁리를 다해 각인 각자 재력(才力)을 사용해 그 형(形)을 제출하는 기술이 아니다.
(반면 미술은) 인심(人心)을 감동시키고 교화(敎化)를 돕는 작용, 사람의 정신(精神)을 쾌락(快樂)의 별천지로 끌어내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환희(歡喜)하도록 하는 등의 것, 인심을 위안하고 쾌락을 주는 작용, 지식(知識)을 열어 학술(學術)을 도우는 등의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고가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
인지(認知)를 개도하고 백반학술(百般學術)의 도움이 된다. 공예(工藝)를 발전시키는 근원이 되어 백반의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
요컨대 서예는 조형(造形)예술도 아니고 인심(人心)을 감동 교화시키지도 못함을 물론 실용(實用)예술로도 가치가 없다는 논지다. 사실 서예에 대한 이러한 언설은 지금에 와서 보면 고야마 쇼타로는 물론 당시 사회가 서예에 대해 얼마나 무지에 가까운 천박한 인식에 사로잡혀있는 것인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서예야말로 문자 그대로 문학(文學)과 미술(美術)은 물론 수양(修養)과 실용(實用)까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예술이 아닌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당시 서예가들이 이에 대해 어떤 반론이나 상대되는 독자적인 대안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미술에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조선에서 식민지가 종식되고 난 이후에도 강화되는 서구화바람을 타고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여하간 일본에서 서예는 1905년 권업박람회(勸業博覽會)전시장을시 마지막으로 미술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그 여파는 당장 식민지 조선에 불어 닥쳤고 조선미술전람회(朝鮮美術展覽會)에서마저 서예는 1932년 10회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퇴출되었다. 그리고 전통시대 조선예술의 장자방을 자처한 서예는 신식학교에서 발조차 들여놓을 수 없게 된것이다. 또한 정규교육에서 밀려난 서예는 공모전(公募展)과 서숙(書塾)을 전전하며 근 100년간 목숨을 부지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예술마저도 철저히 시장논리가 지배하는 지금 현실로 말하자면 관객이 없는 서예장르란 이런 뿌리깊은 원인으로 인해 서구미술의 힘에 대적할 수 없는 시절을 만난것이다. 심지어 20세기 서구추상미술(西歐抽象美術)의 뿌리가 동아시아 서예임을 정작 당사자들이 고백하고 있지만 서예문맹이 된 우리는 서예언어로 된 유전인자 번홀르 속속들이 따져가며 그 자식과 같은 작품들을 알아볼 눈을 사실상 상실하고 만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서예에 관한 이런 오늘의 실상은 100년의 외부적인 강권(强勸)과 자초(自招)의 결과이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붓을 쥔 사람의 무능으로 귀결된다.
Ⅱ-2. 서예의 정의: 서예(書藝)는 미술(美術)과 문학(文學)의 합 이상이다.
다시 논의를 처음으로 되돌려 보면 서화에서 미술로 20세기 근 현대 한국의 예술판도가 재편되는 시점에서 서예는 서구인들의 시각에서 잘 봐주어도 그들의 캘리그라피(Calligraphy)정도였고 실제로는 생소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더 이상 미술도 아니고 그래서 예술이 아니었다. 서예에 대한 근본 이해가 없는 서구인들은 물론이지만 서구미술과 예술에 뿌리 채 경도된 자국인(自國人)들조차 앞장서서 서예를 미술로도 예술로도 간주해 줄 리도 만무하였던 것이다.
재삼 언급하지만 결국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미술판과 같이 서예판을 제도교육이라는 동등한 입장에서 제시하고 획득하지 못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동시대를 살아간 서예가들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근 100년이 지난 지금 서예의 독립과 부활을 쟁취해야 될 책임또한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지금에 와서 보면 서예는 오히려 시각예술에만 호소를 하는 미술보다 더 큰 상위개념에 있다. 그래서 ‘예술이다’ ‘아니다’를 논하는것 자체가 무지의 소치일 수 밖에 없다.
서예(書藝)는 말 그대로 ‘글씨예술’내지는 ‘문자예술’이다. 문자(문자)를 떠나 존재할 수 없는 특수 장르다. 그래서 ‘서예언어(書藝言語)’는 문장(文章)과 조형(造形)이 하나되는 지점에서 제대로 읽혀진다. 그래서 서예는 문장만도 아니고 또한 조형만도 아니다. 이 점에서 서예는 문장내용과 문자조형, 즉 텍스트와 이미지가 하나가 되는 지점에서 성립되고 이를 넘어서는 지점에서 독자적인 서예언어(書藝言語)가 발생된다.
서예언어는 시각언어이자 동시에 말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지만 서예언어는 텍스트로서 말언어가 고정불변의 요소라면 문자라는 시각조형언어는 동일한 텍스트라도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동일한 사람이라도 쓰는 시점에 따라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서예언어는 문장내용으로서 텍스트보다 문자조형으로서 이미지가 더 우선해서 중요시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서예는 고정불변인 말언어로서 문자를 떠나 존재할수도 없지만 시각언어로서 변화불측의 문자조형이 서예를 선도한다는 입장에서 서예술의 더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 그래서 서예는 문학이기도 하고 미술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학과 미술을 넘어선 자리에 서예의 본질이 위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오지랖이 넓다면 넓은 서예는 이런 이유로 근 100년의 세월동안 문학은 물론 미술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예술도 아닌 것으로 오해의 시대를 살아왔다. 이것은 한글전용과 키보드시대, 다시말하면 한자문맹(漢字文盲)과 서예문맹(書藝文盲)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일수록 더 가속화 되고 있다.
그래서 예술가로서 탄허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가 생존했던 20세기 근현대 한국에 있어 서의 사정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본고 ‘탄허 택성의 서예미학’에서 문제 삼고 있는 ‘서예’는 이처럼 그 정체성에 있어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앞서 본대로 ‘식민지(植民地)’ ‘서구화(西歐化)’로 대표되는 20세기 한국역사에서 ‘서’는 공식적으로 미술도 아니었고 그나마 전통시대 서화일치 서화동원으로 같이 하나로 놀았던 그림마저 서를 내팽개친 것이다.
더구나 서예가(書藝家)로서 탄허의 글씨가 아니라 교선일치(敎禪一致)나 선교겸학(禪敎兼學)의 선장(禪匠)으로서 탄허의 글씨인 선필(禪筆)을 논한다는 것은 그나마도 우리시대 서예를 장악하고 있는 서장(書匠)글씨판에서는 언급을 회피하거나 논외로 치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사실 탄허 만큼 유가(儒家) 불가(佛家) 도가(道家)의 삼교(三敎)를 하나로 회통(會通)시켜가며 이를 서예로 담아낸 작가가 우리서단에서 제대로 있었는가를 묻는다면 대답이 궁색해 진다. 탄허는 불교경전 가운데에서도 최고인《화엄경(화엄경》을 완역한 것은 물론 유교경전인《주역(주역)》과 노장사상을 대표하는《노자도덕경(노자도덕경)》《장자(장자)》를 늘 같은 반열에서 종횡으로 강의하고 번역을 해낸 인물이다.
한자(漢字)가 일상에서 거의 사어(死語)가 되다시피 한 우리시대에 서예의 기본전제조건인 문장과 학문에 탄허처럼 갖출 것을 요청하는것 자체가 무리이지만 이런 조건에 아예 눈을 감는 듯한 태도는 한국서예의 미래를 위한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Ⅲ. 탄허서예의 조형(造形)특질
Ⅲ-1. 탄허서예의 조형(造形)분석과 특질
그렇다면 먼저 시각 조형적 측면에서 서예언어, 즉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서예(書藝)라고 부르는 글씨예술로서 탄허의 서예를 글씨조형의 특질과 미학적(미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
우선 탄허의 글씨조형의 특질은 점획(點劃) 결구(結構) 장법(章法)이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점획의 길고 짦음 기울기 정도 굵고 가늘기 굽고 곧음 따위는 물론 이러한 점획들의 소소(疎疎) 밀밀(密密)한 관계들이 만들어내는 글자의 짜임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품의 전체화면 안에서 글자와 글자의 대소(大小)나 강약(强弱)의 크기가 만들어내는 장법으로서의 공간경영이 탄허 서예의 조형적 특질을 결정한다.
예컨대 진묵조사(震黙祖師, 1562~1633)의《제모문(祭母文)》8폭병(월정사 성보박물관 소장) 중 제 1, 2, 3, 4폭의 글씨조형을 보자. (도판1) 1970년대 후반의 필적으로 60대 후반의 탄허가 이전홍(李佺洪)이라는 사람한테 써준 것이다.
태중(胎中)의 열 달 은혜 어떻게 보답하랴,
슬하(膝下)의 삼년 기르심 어찌 잊으랴.
만세에 또 만세를 더 사셔도 자식 된 맘 오히려 부족한데
백년 중에 백년도 못 사시니 어머님 수(壽)가 그리도 짧은가.
서체는 행초서(行草書)인데 먼저 필획(筆劃)을 보자. 곡직(曲直)의 대비보다 지나칠 정도로 (直劃)이 강조되고 있다. 사실 다음에 보겠지만 탄허의 글씨조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을 하나만 꼽으라면 빠른 필속(筆速)으로 시원하게 죽죽 내리긋는 송곳같은 강하고 예리한 획을 들수있다. 심지어 점마저도 이런 획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마치 온통 화면이 한줄기 장대비가 내리는 장면을 포착해 놓은 지경이다. 이와 동시에 필획의 장단(長短) 대비를 극도로 가져감으로 해서 탄허의 글씨공간에서 직필(直筆)은 더욱더 강조되는 효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과장된 직획의 일관된 강조는 결국 탄허가 글씨공간을 허(虛)하에 경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글자가 구사된 공간보다 여백이 더 강조되는 듯한 착각에 빠지는 이러한 운필과 공간경영태도는 결국 작품에서 탄허만이 갖는 통쾌(痛快)한 미감을 배가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제1폭>의 ‘中’자의 종획(縱劃)이 가늘고 길게 처리된 반면에 ‘十’자는 극도로 굵고 짧은 획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之’자나 ‘河’자 등도 마찬가지다. 더 나아가 ‘恩’‘萬’‘年’‘也’와 같은 글자에 가서는 ‘구(勾)’획 따위를 과장하여 허(虛)한 공간을 극도로 넓게 확보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허(虛)’는 그냥 필획이 지나가지 않은 물리적 공간으로서 허가 아니라 필획이라는 ‘실(實)’의 공간과 다이나믹하게 조응(調應)하는 공간으로서 허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글자의 짜임새에 가서는 시종일관 필획을 균등(均等)하게 배치시키면서도 그 기울기를 동세(動勢)가 가장 두드러지는 30~45도(度) 전후로 가져감으로 해서 활달(豁達) 자재(自在)한 작품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장법(章法)에서 마저도 탄허는 글자와 글자간의 대소(大小)크기를 극단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다. 예컨대 ‘胎’‘恩’‘年’‘萬’‘年’‘也’따위 글자가 극도로 크다면 ‘以’‘下’‘之’‘上’‘子’‘母’따위는 극도로 작다. 이대로 라면 글자간의 대비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보통의 공간경영원리에도 합당하지 않다. 하지만 탄허의 경우 서로 극도로 대비되는 음양(陰陽)요소를 오히려 전체화면에서 조화롭게 살려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年’이나 ‘歲’와 같이 짧은 문장 안에 동어반복(同語反覆)으로 등장하는 동일한 글자의 자형(字形)에 가서는 전혀 다른 서체와 구조로 강조 처리되고 있다. 보통 글씨작품에서도 동어반복은 이체자(異體字)로 다스리는 것이 상식이지만 턴허의 작품공간에서는 매우 다양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화되고 있다.
사실상 2폭의 ‘年’ 3폭의 ‘年’ 4폭의 ‘年’은 다 같은 ‘年’ 이지만 자형과 서체는 각각 전혀다른 세 가지로 글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정도다. 이러한 경우는 2폭의 ‘歲’와 3폭의 ‘歲’도 마찬가지다. 다 같은 행초지만 ‘歲’의 복잡한 행초필획을 있는 대로 구사한 것이 전자라면 글자의 하반부를 ‘夕’으로 극도의 단순한 구조로 생략 처리한 것은 후자다. 여기서 탄허가 문장은 물론 자유자재의 글자구조의 운용을 통해 그냥 일상의 문자(文字)를 서(書)라는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 올리고 있다.
요컨대 탄허의 서(書)공간은 일관된 직필(直筆)구사와 다이나믹한 허실의 ‘사획(斜劃)’ 운용, 그리고 글자의 극단적인 대소(大小) 배치를 통해 종이와 먹 같은 물질공간이나
진묵조사의《제모문(祭母文)》에 따라 문자언어가 말 언어 구조로 물리적으로 배열되고 나열된것을 넘어서고 있다. 결국 진묵조사의 문자(文字)가 탄허의 서(書) 언어로 재해석되면서 만물(萬物)이 살아 무한대(無限大)로 유동(流動)하는 변화불측(變化不測)의 유기적인 우주공간(宇宙空間)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Ⅲ-2. 선장(禪匠)과 서장(書匠)의 글씨조형 비교 ㅡ 탄허와 소전의 경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탄허글씨의 서체다. 공개된 필적으로 보면 지금 살펴본 진묵대사《제모문》과 같은 행초서풍이 출가(1934년, 22세기)를 전후한 20대 초반시기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 생애를 걸쳐 모든 종류의 작품에 일관되게 구사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서예가나 선필의 경우에도 어느정도 주류(主流) 서체가 있고 부차적인 서체를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탄허는 심하게 경도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시기나 작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이와같은 분명한 한가지의 서체적 스타일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제모문》과 같은 본격작품으로서 일련의 병풍류(屛風類)는 말할 것도 없지만 《월정대가람(月精大伽藍)》(1979년, 월정사일주문)《향상일로(向上一路)》(1970년 초, 월정사성보박물관)《판치생모(板齒生母)》(1970년대, 한마음 선원)와 같은 현판,《약인(약인)》(1980년 전후, 월정사성보박물관)《지풍(知風)》(1980년 전후, 월정사성보박물관)과 같은 선면(扇面)작품은 물론《방함록(방함록)》(1977, 탄허기념박물관)과 같은 일상의 글씨마저 일관되게 같은 서풍으로 구사되고있다.
이런 경향은 시기적으로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탄허의 40대 대표적인 필적인 《한암대종사비명(漢岩大宗師碑銘)》(1959년, 평창상원사)이나 50대의《오대산월정사법당중창대시주송덕비명(五臺山月精寺法堂重創大施主頌德碑銘)》(1969년, 월정사 천왕문)《동정각(動靜閣)》(1960년대, 월정사성보박물관)《주련》(1960년대 월정사성보박물관)을 비교해보아도 거의 같은 서풍이다. 이런추세는 《내소사해안당부도비(來蘇寺海眼當浮屠碑)》(1974년, 부안 내소사)에서 보듯 60대는 물론 입적 한 해 앞인 70세 때 작품인《우필차송(優畢叉頌)》10곡병(1982년, 월정사성보박물관)을 보아도 50대를 전후한 절정기 필력과 마찬가지다.
오히려《어약연비(魚躍鳶飛)》(1980년초, 지광사)《관서유감(觀書有感)》(1980년초, 지광사)《쇄수게(쇄수게)》(1980년초, 지광사)와 같은 작품에서는 50대보다 더욱더 활달(豁達)자재(自在)한 필력을 구사하고 있다. 보통 작가의 경우 말년작품의 필획이나 결구는 전성기인 50대에 비해 살점보다 골기가 드러나면서도 강건함보다 온화감이 지배적이나 탄허 필적은 이러한 일반의 상식을 벗어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한자(漢字)만 하더라도 전서(篆書)나 예서(隸書)는 물론 해서(楷書)를 중심으로 해행(偕行) 행초(行草) 초서(草書)로 다양하게 서체조형의 변화를 가져가는 동시대 서예가들과는 많이 다름은 물론 어떤 형식이나 시기를 불문하고 같은 대체적으로 같은 서풍으로 구사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20세기 한국 근 현대의 서예를 주도적으로 이끈 소전(素筌) 손재형(孫在馨, 1903-1981)을 보자. 이자레는 비단 소전뿐만 아니라 일중 김충현(1921-2006) 검여 유희강(1911-1976) 소암 현중화(1907-1997) 등과 같은 여러 서장(書匠)들을 모실수 있다. 본고에서는 탄허와 소전의 글씨를 비교하면서 동시대를 선장(禪匠)으로 살아온 삶과 서장(書匠)으로 살아온 삶까지를 비교해보자.
소전 또한 탄허와 마찬가지로 개화기 일제강점기 분단과 6.25산업화를 살아오면서 서예로 생을 관통한 사람이다. 소전의 서예의 이력이 서화(書畵)에서 미술(美術)로 전이되는 20세기 우리의 서예의 자화상(自畵像)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전(鮮展)’을 통해 소전이 서예가로 태어났다면 소전은 1945년 광복(光復)이후 서예가 제도교육에서 제외된 시대에 ‘국전(國展)’을 창설(1949년) 하여 서예를 다시 살려내었고 이를 통해 영욕(榮辱)의 30년을 건사하였다. 사실 오늘날 붓을 쥐고 행세하고 있다는 사람은 모두 음으로 양으로 소전의 덕을 안본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다.
소전의 서예는 그의 일생이 그러하듯 거침없는 붓놀림으로 특징 지워진다. 한글과 한자(漢字)는 물론 문인화 전각 까지 넘나들었다. 그가 53세가 되는 1955년(乙未)전후 효자동 자택은 그 용광로인 셈이다. 요새말로 하면 융복합 컨셉으로 대놓고 작품을 즐겨한 사람이 소전이었다. 특히 전서(篆書)의 필획(筆劃)으로 한글 고체(古體)는 물론 행초(行草)까지 종횡무진(縱橫無盡)으로 해냈다. 바로 이 지점은 서예언어(書藝言語)로 20세기를 말한다면 가장 특징적인 지점의 하나다.
사실 동시대를 살아간 대부분의 작가들이 정도의 차인느 있어도 소위 비파(碑派)와 첩파(帖派)구분의 경계가 되는 전예와 행초를 넘나들며 각체를 두루 섭렵하여 혼용하고 있는 것이 근 현대 서예의 뚜렷한 특징이다.
하지만 탄허의 경우 앞서 본대로 소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행초서 일변도의 글씨만 구사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조형성(造形性)의 창신을 화두로 하는 우리시대 직업적인 프로작가로서 전문서예가들과는 다른 선장선묵의 대체적인 특성이기도 하다.
탄허 글씨는 각체 혼융의 소전글씨와 비교하면 서체조형이나 미감에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 변화불측한 서체조형실험을 목표로 두고 있는 서가들의 기준으로 볼때 탄허 글씨가 시종일관 같은 서체로 구사된 나머지 단조로움을 넘어 스트레오타입의 지루함까지 느껴질수 있는 정도라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탄허 글씨의 격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말은 아니다. 더구나 탄허라고 하는 선장선묵의 서예언어자체 안에서 마저 변화가 없다는 뜻도 아니다. 앞서본 대로 오히려 행초서 안에서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붓끝을 가지고 탄허는 자신만의 서예언어를 통해 동시대 어떤 작가보다 변화불측의 공간을 경영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소전의 전예와 행초를 넘나드는 서체간의 구조적인 혼융변화와 탄허의 행초 안에서의 점획변화의 성격이나 수준을 바로 맞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점을 유의하면서 선장과 서장의 글씨가 어떻게 다른지 앞서본《제모문》을 염두에 두면서 소전의 대표작중의 하나인《해내(해내) . 천애(천애)》를 비교해보자
海內存知己세상 곳곳마다 나를 알아주는 이를 두었다면
天涯若比隣천하 모두 이웃과 다름없을텐데.
이 작품은 문장의 냉요에서부터 6.25전쟁이 막 끝난 나라사정과 소전의 개인 심사가 묘하게 오버랩되고있다. 이 시의 작자는 27세에 요절한 당(唐)나라 왕발(王勃)인데 그의 한탄이 소전의 붓끝에서는 서로 다른 서체의 필획이 부둥켜안고 사무치는 외로움으로 울고있는 듯한 구조다.
물론 비첩(碑帖)혼융하면 우리 서예의 역사에서는 소전이 자신의 당호를 ‘존추사실(尊秋史室)’로 특정할 정도로 신앙한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먼저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소전은 추사의 껍질을 그냥 박아 내지 않았다. 추사체(秋史體)의 근원을 거슬러 가면 예서(隸書) 중에서도 서한(西漢) 예서를 만난다.
소전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가 전서(篆書)를 불러내어 전형적인 소전(小篆)중심의 전서(篆書) 필획으로 전예와 해행의 결구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역으로 무자비하게 조형을 주무르고 작품공간을 경영하고 있다. 작품전체를 관통하는 무쇠몽둥이 같은 필획으로 ‘海’의 공간을 바다처럼 텅 비우면 ‘內’는 극도로 좁히고 ‘存’의 필획을 극도로 생략하면 ‘存’는 과장시키다. 이런 기조는 ‘己’와 ‘天’이나 ‘涯’ ‘若’ ‘比’ ‘隣’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서가들은 ‘창조(創造)’라 부르지만 그 근원은 고전(古典)이다. 결국 창조와 고전의 한 몸이고 창조의 밭은 고전이 아니면 안되는것임을 여기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요컨대 ‘소전체(素筌體)’는 울분과 비통의 오늘을 태고(太古)로 버물어 붓으로 토해낸 것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탄허의 경우 앞서 본 대로 점획은 물론 결구나 장법에 있어 소전의 경우처럼 전예까지 넘나들고 있지 않다. 물론 그 이유는 탄허가 서예의 형상성 창조 그 자체에 목적을 둔 서예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장으로서 서예를 선수행의 여기로 삼은 사람이다. 탄허가 조형실험(造形實驗)보다 선수행을 통한 필묵(筆墨)의 정신성(精神性)의 발현에 우선순위를 두는 서작(書作)태도는 오히려 당연한 처사고 결과라 할 수 있다.
Ⅳ. 탄허서예의 미학(美學)과 서예역사
Ⅳ-1. 불가(佛家)와 유가(儒家)의 서예철학 비교
- 탄허 택성과 퇴계 이황의 경우
이런 입장에 있는 탄허의 서작태도나 미의식(美意識) 내지는 정신경계(精神境界)는 오히려 시대도 다르고 선승도 아닌 도학자(道學者)인 퇴계 이황(1501-1570)과 같은 인물과 곧잘 비교될 수 있다. 흔히 글씨를 정의하면서 사람과 직결시켜 말한다. 그 이유는 글씨에 사람의 성격(性格)이나 심리상태(心理狀態)는 물론 학문(學問)이나 수양(修養)의 정도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예미학의 첫 번째 명제라 할수있는 ‘글씨는 그사람이다[書知其人]’는 말이 이러한 사실을 방증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유가뿐만 아니라 불가와 도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물론 춤이나 미술 음악 등과 같은 장르도 작가나 예술가의 성정(性情)과 기질(氣質)을 직접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글씨처럼 시종일관 행위자의 예술성격을 넘어 수양문제에 까지 직결시킬 정도로 노골적이지는 않다.
그 이유는 서구의 현대미술이 외부(外部)대상인 자연물(自然物)을 묘사(描寫)하거나 재현(再現)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면 서(書)는 전적으로 작가의 내면세계(內面世界)를 표출(表出)하는데 무게중심이 주어져 있는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물질(物質)중심의 산업사회(産業社會)에서 인간(人間)의 소외(疎外)나 정신의 황폐화 따위를 점선면으로 표출해낸 20세기 서구(西歐) 추상미술(抽象美術)마저도 동아시아 서예와 무관하지 않다.
본질적으로는 도덕적(道德的)으로나 인격적(人格的)으로 수양(修養)이 잘된 사람은 글씨도 바르다거나 글씨를 바르게 쓰면 인격도 바르게 된다는 서예에 대한 뿌리깊은 인식이나 생각도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예컨대 문예(文藝)를 도덕(道德)의 발현으로 간주한 퇴계(退溪) 이황(이황, 1501-1570)의 서예관(書藝觀)은 마음을 쓰는 심법(心法)과 글자를 쓰는 자법(子法)이 동일하다는 생각으로 표명되고있다. 1560년 60세가 되는 퇴계가 제자 정유일(鄭惟一)에게 내린「습서(習書)」시에는 이러한 글씨에 대한 입장이 잘 드러나 있다.
글씨에 대한 이런 태도와 생각은 비단 퇴계 뿐만 아니라 당시 도학자(道學者)들에게도 흔히 확인된다. 시주(時註)에서 퇴계는 “근래 조맹부(趙孟頫)와 장필(張弼)의 글씨가 세상에 성행하나 모두 후학을 그르친다.”라고 경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습서》시를 관찰해보자.
자법(字法)이란 본래부터 심법(心法)의 표현이라,字法從來心法餘
명필(名筆)이 되자고 글씨 익히는 것 아니라네習書非是要名書
창힐(蒼頡)·복희(伏犧) 제작은 저절로 신묘(神妙)하였고,蒼羲制作自神妙
위(魏)·진(搢)의 풍류(風流)라서 방탕하고 소흘하리.魏晉風流寧放疎
吳興[조맹부]을 익히다간 옛것마저 잃기 쉽고,學步吳興憂失故
東海[장필]를 본뜨다가 헛것 될까 두렵구나.效顰東海恐成虛
다만 점 . 획마다 순일(純一)을 지녔다면,但令點書皆存一
세상의 뜬 훼예(毁譽)에 관계될 게 없고말고.不係人間毁譽
이 시에서 보듯 퇴계는 ‘자법(字法)은 곧 심법(心法)이기 때문에 점획을 오로지[存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글씨를 쓰는 사람의 마음이나 태도가 필적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심성론적(心性論的) 글씨관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도학자(道學者)인 퇴계는 생각은 물론 학문과 언행까지도 거경궁리(居敬窮理)로 일관하였다. 그의 도학사상을 해명하는 핵심단어인 ‘사단칠정(四端七情)’이나 ‘리기심성(理氣心性)’이 말해주듯 퇴계는 매사를 인욕(人慾)을 막고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천리(天理)를 보존하면서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데에 궁극적 목적을 두었다.
퇴계는 이러한 존천리(存天理)의 구체적 실천사례의 하나로 글씨를 들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퇴계가 원나라 오흥출신의 조맹부나 명나라 때 광초(狂草)로 유명했던 장필의 글씨를 경계하고 있는 대목이다. 바로 ‘吳興[조맹부]을 익히다간 옛것마저 잃기 쉽고, 東海[장필]를 본뜨다가 헛것될까 두렵구나’ 한 것이 그것이다. 퇴계는 행여 제자들이 고법(古法)을 상실하고 허영(虛榮)에 찬 글씨에 빠질까를 시를 써서 극도의 경계하였던 것이다. 퇴계의 이러한 경제는 당연히 송설체가 지나치게 화려연미(華麗娟媚)하고 장필의 글씨가 과장과 허세가 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하자면 조맹부의 송설체나 장필의 광초로는 점획의 순일성(純一性)과 경(敬)의 자세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여겼던 것이다. 우주만물(宇宙萬物)의 이치(理致)와 인간의 심성(心性)을 하나로 인식하고 현실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요체로 하는 도학(道學)은 글씨마저도 심성연마와 직결된다고 간주하였다.
말하자면 퇴계는 글씨도 인격(人格)의 현시(顯示)이자 심성(心性)의 표현(表現)이기 때문에 부단히 연마하되 항상 마음을 오로지하는[存一] 경의자세를 유지하려 하였다. 이러한 퇴계의 관념은 주희(朱熹, 1130-1200)가 서자명(書字銘)에서 ‘한 점 한 획에 순일(純一)함이 그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한것과 상통된다. 퇴계의 이러한 글씨에 대한 철학과 입장은 조형적으로는 해서(楷書)나 행초서(行草書)할 것 없이 방정(方正)한 필법과 단아한 글자짜임새로 확연히 드러남은 물론 미감에서도 순일무잡(純一無雜)한 경계를 구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글씨를 자세히 살펴보면 선필의 성격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선수행 또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도학자들의 존일(存一)이나 순일(純一)의 경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말의 진의는 물론 앞서 본대로 서예의 근본이 글자의 형상을 얼마나 잘 쓰고자 잘 꾸몄는가에 있지 않다는 것이기도 하다.
오히려 형상(形象)에 골몰하는 이런 입장은 특히 근 현대에 들어 부각된 전문 서예가들의 몫이지만 형상에 앞서 정신을 우선해서 배치시키는것은 선필이나 도학자드의 글씨나 마찬가지다. 물론 이 말이 형상을 도외시하고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지만 선수행의 요체또한 상(相)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것에 있음을 말하는 분명한 근거가 된다.
그래서 ‘탄허가 相과 亡相이 둘이 아니다’고 갈파한 아래의 언설에 비추어보면 글씨마저도 어떤 입장과 태도로 구사하였을지를 짐작할 수 있다. 설법을 하듯 구체어로 거칠게 구사되고 있지만 가르침의 요체는 분명하다. 우선 그 전문을 보자.
“相과 亡相이 둘이 아니다. 몸뚱이와 미음이 둘이 아니다. 에디손이 과학을 발명하여 전등을 켜고 기차를 타고 함니다. 부시낏과 태양과 선과 유리알이 서로 합할 때 그 초점이 바늘 끗과 갗적었을 때 불이 납니다.
전기가 모양이 없으되 전등을 만나면 불이 옵니다. 부숫끼이 아무리 있다 해도 태·양을 못 만나고 초점이 아니 되면 인연이 못만나면 나타나지 않음니다. 인연이라는 하는 것은 九 十六種外道因緣法 拘戒의 外道과 天戒이 없을 때 참 나인 나타난다.”
탄허는 위의 글에서 우상(相)과 망상(亡相)이 둘이 아님을 몸뚱이와 마음이 둘이 아니고, 전기와 전등불이 둘이 아님을 빌어 설명하고 있다. 심지어 생(生)과 멸(滅)이 두마음이 아니고 지옥(地獄)과 천당(天堂)마저도 둘이 아님을 설파하고 있다.
이러한 언설을 다시 탄허의 글씨에 그대로 적용해보자. 시종일관 탄허의 생애 전작에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이 장대비로 내리 꽂는 탄허 글씨의 필획조형은 탄허의 선기의 직접적인 표출인 것이다. 탄허가 “전기가 모양이 없으되 전등을 만나면 불이 옵니다.”고 한 것처럼 탄허의 선기는 애초 형상이 없지만 붓과 먹을 만나 화면에 문자구조로 서예언어로 형상화 되는 것이다.
여기서 선가에서 말하는 ‘불립문자(不立文字)’는 문자가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문자를 통해 염화시중의 미소를 보는 경지임을 알 수 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는 말 자체가 문자의 자구(字句)에 메여 그 진의(眞意)를 정작 못 보는 지경을 경계한 것이다. 요컨대 전기불이 전등(電子)을 통한 전자의 기적(氣的) 표출이듯 전등과 같은 존재인 글씨는 창작주체의 성정기질을 여하히 드러내는가 하는 점과 직결된다.
이런 맥락에서 앞서 본대로 심신수양으로서 도학(道學)의 실천과 이상이 존일(存一)하게 글자에 드러나는 것이 유가(儒家)서예의 궁극이라면 선수행의 요체로서 선기(禪氣)가 글씨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선필(禪筆)의 궁극이다.
다시 말하면 선(禪)과 글씨 또한 둘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필획에 드러나는 탄허의 선기라는 것은 어떤 지점일까. 당연히 ‘相과 亡相이 둘이 아니다’고 한 그의 언설에서 그 답을 구할 수 있다. 예컨대 “지옥(地獄)과 천당(天堂)이 없을 때 참 나인 창조주(創造主)가 나타난다.”고 설파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지점이 바로 마음을 오로지하는 유가의 ‘존일’이나 불가의 분별심(分別心)이 없어진 ‘불이(不二)’의 경지다. 또한 여기서 두 가지 붓은 하나의 붓으로 통한다.
Ⅳ-2. 선묵(禪墨)의 정의
-선승(禪僧)이 모두 선필(禪筆)은 아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스님만의 글씨를 가지고 선묵(선묵)을 규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유가(儒家)이지만 유(濡) 불(佛) 선(仙) 삼교를 회통한 추사(秋史) 김정희(김정희, 1786-1856)의 《불이선란도(不二禪蘭圖)》를 보자.
이 작품은 서법(書法)과 화법(畵法)이 둘이 아닌 초예기자지법(草隸奇字之法)으로 글씨를 쓰듯 난(蘭)을 쳐서 묵선(墨禪)이기도 하고 선묵(禪墨)의 표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묵의 본질과 창작의 주체를 따지는 이 시점에서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지점은 따로 있다. 바로 《불이선란도》의 제시다.
不作蘭花二十年난을 치지 않은 지 이십 년에,
偶然寫出性中天우연히 본성의 참모습을 그렸네.
閉門覓覓尋尋處문을 닫고 찾고 또 찾은 곳,
此是維摩不二禪이 경지가 유마거사의 불이선이로세.
난(蘭)을 두고 춧가는 바로 유가의 궁극적인 세계인 성중천(性中天)과 불가의 궁극적인 세계인 불이선(不二禪)의 경지를 하나로 만나고 있다. 이미 말로서 설명이 불가능한 두 세계를 추사는 필(筆)로서 경계 없이 넘나들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예에서 보듯 선묵은 오로지 깨친 자 만이 가능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선승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선(禪)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감각(感覺)과 의식(意識)의 세계를 넘어선 직관(直觀)에 있다고 할 때 경우에 다라서는 우리가 최고의 성취라고 치는 난화(蘭花)는 물론 여러 제시의 글씨마저도 당사자를 떠나면 무의미해 질 수 있다. 아무나 그 경지를 따라 한다고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시대 서예가나 화가 들이 왕왕 《불이선란도》 난화나 제시의 글씨를 따라 그리고 쓰는 경우를 본다. 물론 공부라는 입장에서는 가능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이미 ‘그린다’고 ‘쓴다’고 그 세계가 다시 오는 것은 아니다. 이미 그려지는 순간 허상(虛像)에 불과 할 뿐이기 때문이다. 앞서 본대로 탄허는 상(相)과 망상(妄相)은 둘이 아니라고 했지만 상(相)은 상(相)일 뿐인 것이다. 비슷핝 상은 이미 상도 아니고 망상도 아닌 것이다.
요컨대 이런 맥락에서 탄허의 글씨세계는 스님이다 아니다를 떠난 지점에서만이 제대로 보인다. 역설적이지만 스님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낼 때 만이 탄허 글씨의 본질적인 속살이 그대로 들어날 것이다. 석정(石鼎,1928-2012)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바 있다.
“대채로 그림이나 글씨에 선묵(禪墨)이라는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선화(禪畵)가 화법이 따로 있지 않고 선서(禪書) 역시 서법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동양화와 서양화, 조각 등 어떠한 미술이든지 소위 선(禪)적인 요소가 있다면 선화요 선조각이요 통틀어 선 미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선 그자체가 문제이지 장르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석정은 분명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흔히 선필이라 하여 보통 글씨와 따로 존재하고 있는 듯한 오해를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새삼 말하지만 선화나 선서가 화법 서법이 따로 있지 않는 것이다. 동양화는 물론 심지어 서양화 조각 등 어떠한 미술이든지 선기(禪氣)가 충일하다면 서환이고 선조각이 선미술인 것이다. 선화는 ‘달마도’나 ‘원상(相)’을 넘어 장를 초월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사람을 넘나드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선승의 글씨가 다 선필일 수는 없다.
한편 선승(禪僧)의 글씨, 즉 선필(禪筆)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개성만 강조된 나머지 (法)이 무시되거나 예술성을 가늠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선필이라 해서모두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 반대의 지점에도 선필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개성이라는 관점에서 학문의 경지와 기본필법을 내려놓고 탄허의 글씨를 보면 자칫 관자들이 오독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동시대 어떤 서예가 보다 글씨조형이나 필법에서 개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개성으로 치면 탄허보다 더한 글씨를 찾아보기 어렵다면 어렵다.
앞서 《제모문》 조형분석에서 본대로 탄허의 서예공간을 필획을 중심으로 다시 보자. 극도로 과장된 직필(直筆)구사와 허허실실(虛虛實實)하면서도 다이나믹한 ‘사획(斜劃)’운용 그리고 글자의 극단적인 대소(大小) 배치를 통해 장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지를 두고 세간에서는 덮어놓고 선수행의 국극에서 오는 직관의 힘으로 돌리기 일쑤다. 이것이 결국 사실이라 하더라도 서예언어를 무위로 돌리는 이러한 태도는 애초부터 탄허를 선장의 글씨라고 접어놓고 해독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서장 글씨 관점에서는 해독불능이라는 의외의 결과를 낳을 위험성도 존재한다.
탄허 글씨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이러할 지언정 동시대 내노라고 하는 서예가들도 쉽게 다다를 수 없는 영역으로 자부할 지라도 그 글씨의 온당한 값어치를 메기려 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대로 된 본질적인 평가를 못 내린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다.
Ⅳ-3. ‘서예언어(書藝言語)’ 독해로 보는 탄허 글씨의 토대와 본 모습
요컨대 탄허 글씨의 개성적인 조형문제는 개성이전에 탄허 글씨를 있게 한 어떤 전형(典型)의 자기화와 정신성으로서 선수행이 여하히 내재되어있는가 하는 점이 밝혀지면 해명될 일이다. 하지만 불경(佛經)은 말할것도 없지만 유가(儒家)나 노장(老莊)까지 달통한 탄허가 정작 지금 글씨조형의 토대가 되는 어떤 법첩을 가지고 속가나 불가에서 글씨공부를 했는지는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있다면 탄허가 19세(193년)때 쓴 《간산필첩(艮山筆牒)》(월정사성보박물관) 27세(1939년)때 쓴 《사자산 흥법사 법당중건 상량문(獅子山興法寺法堂重建上梁文)》(월정사성보박물관) 정도 이다. 이 두 가지 자료는 탄허의 필재(필재)는 타고 났음을 확인시켜준다는 점과 학서기인 20대를 전후한 시기에 탄허가 조선글씨의 토대가 되는 왕법(王法)은 물론 당시 유행한 추사체(秋史體)까지 학습했음을 밝히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좀더 상세한 탄허의 학서과정은 지금으로서는 향후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다만 지금 본대로 20대 출가를 전후한 시기 탄허글씨는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5, 60대 전성기 탄허 글씨와는 서풍(書風)측면에서는 두 사람의 손에서 나온 듯 딴판으로 구사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탄허 글씨라고 하면 서체구조나 마감으로 뇌리에 박혀있는 그 글씨의 근원이나 뿌리를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서예가의 글씨가 그러 하지만 탄허글씨의 조형근원은 바로 탄허의 서체조형 그 자체에서 찾아진다.
탄하에게 있어 이러한 문제는 사실 ‘탄허의 서예미학’으로 ‘예술가로서 탄허’를 조명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 하는 바이지만 서장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정작 탄허 자신에게는 애초 염두에 두지도 않았던 문제일 수도 있다. 이것은 물론 탄허가 글시를 아무렇게나 대하고 학문이나 선수행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가치하게 취급했다는 뜻이 아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목도하듯 이렇게 산보다 높게 부지기수의 묵적을 탄허가 지금 쌓아 놓았겠는가. 탄허가 얼마나 글시를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는 바로 여기서 역으로 증명된다. 선장 탄허에게 있어 선과 같은 또 하나의 일상은 글씨인 것이다. 서장에게 있어 일상자체가 글씨라면 이들과 입장이 다른 선승으로서 탄허는 선을 글씨로 했다고 할 수 있다.
앞서본 대로 이것은 마치 퇴계와 같은 조선시대 도학자들이 서(書)를 학문의 여사로 간주한 경우와 궤를 같이 한다. 다시 말하면 도학자들은 글씨자체를 못써서도 아니고 학문(學問)보다 못해서도 아니면서 굳이 시(時)를 짓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를 학문에 앞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다. 앞서본 추사의 경우도 우리역사에서 서예가를 넘어 학예일치(學藝一致)의 경지를 실천해낸 거장이자 대예술가로서 추앙해 마지않지만 경학자(經學者)로서 입장은 퇴계와 마찬가지다. 요컨대 탄허는 퇴계나 추사와 시대도 다르고 종교나 사상적 입장도 달랐지만 글씨를 통해 퇴계나 추사와 같이 학문과 수행의 경지를 있는대로 표출해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탄허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