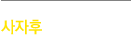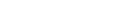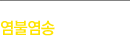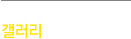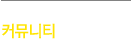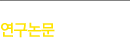[월정사 역사와문화] - 14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 관리자 작성일14-02-11 14:37 조회4,466회 댓글0건본문
Ⅳ. 근대 이후: 전통을 품은 선(禪)과 화엄의 새로운 산실
3.
방산굴에서 화엄선의 세계를 펼쳐낸 선사- 탄허택성
탄허택성(呑虛宅成, 1913~1983) 스님은 20세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고승 중의 한 분이다. 대강백, 대종사, 유불선을 회통한 도인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는 것에서 보듯이 스님은 일대의 대선사이자 대강백이었다.
1913년 음력 1월 15일, 전북 김제에서 독립운동가인 율재(栗齋) 김홍규(金洪奎) 선생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속명은 김택(金鐸), 본관(本貫)은 경주(慶州)이고, 자(字)는 간산(艮山), 법명은 택성(宅成 또는 鐸聲), 법호는 탄허(呑虛)이다.
어려서부터 10여 년간 부친과 조부에게 사서삼경 등 유학을
공부하
며 학문의 경지를 넓혔다. 부친이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1919년부터 1924년까지 옥바라지를 했다. 17세에 기호학파의 이극종(李克宗) 선생에게 각종 경서(經書)를 배웠다. 20세 즈음 ‘도(道)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한암(漢岩) 스님에게 서신을 보냈다. 이후 한암 스님과 20여통의 서신을 주고받았으며, 1934년 음력 9월 5일 22세의 나이에 오대산 상원사로 입산했다. 이때 한암 스님에게로부터 받은 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내온 글을 자세히 읽어보니 족히 도에 향하는 정성을 보겠노라. 장년의 호걸스러운 기운이 넘쳐서 업을 지음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도 모를때에 능히 장부의 뜻을 세워 위없는 도를 배우고자 하니 숙세(宿世)에 심은 선근(善根)이 깊지 않으면 어찌 능히 이와 같으리오. 축하하고 축하하노라. 그러나 도(道)가 본래 천진하면 방소(方所)가 없어서 실로 가히 배울 게 없다. 만일 도를 배운다는 생각이 있다면 문득 도를 미(迷)함이 되나니, 다만그 사람의 한생각 진실됨에 있을 뿐이다. 또한 누가 도를 모르리오만, 알고도 실천을 하지 않으므로 도에서 스스로 멀어지게 되나니라. 예전에 백락천이 조과선사에게 도를 물으니 사가 이르기를,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할지니라.” 하니, 백락천이 이르되, “그런 말은 세 살 먹은 아이라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선사가 이르시되, “세 살 먹은 아이라도 비록 말은 할 수 있지만, 팔십 먹은 노인이라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하시니, 이 말은 비록 얕고 속된 것 같으나 그 가운데 깊고도 오묘한 도리가 있으니, 깊고 오묘한 도리는 원래 얕고 속됨을 여의지 않고 이루어지나니라. 반드시 시끄럽다고 고요한 것을 구하거나, 속됨을 버리고 참됨을 향하지 말지니라. 매양 시끄러운 데서 고요함을 구하고 속됨 속에서 참됨을 찾아, 구하고 찾는 것이 가히 구하고 찾음 없는 데 도달하면, 시끄러움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