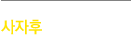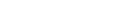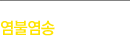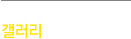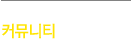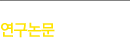[월정사 역사와문화] - 13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 관리자 작성일14-02-11 14:16 조회4,651회 댓글0건본문
Ⅳ. 근대 이후: 전통을 품은 선(禪)과 화엄의 새로운 산실
2)
한암 스님과 오대산의 선풍(禪風)
스님은 1905년 30세의 젊은 나이에 통도사 내원선실 조실로
추대되어5년 동안 납자들을 지도하였다. 이후 평안도 맹산 우두암으로 옮겨 혼자수행에
전념하였다. 1921년에는 금강산 장안사에 머물렀고, 건봉사에서 수행결사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1923년 봉은사에 주석하며 조실로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1925년 여름 서울에 대홍수가 발생하여 한강이
범람하였고, 스님은 나청호(羅晴湖) 스님과 함께 수많은 인명을 구해냈다. 이후 스님은 일제의 감시와 압제가 이어지면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없었다.
한암 스님은 50세 되던 1925년에 서울 근방의 봉은사(奉恩寺)의 조실(祖室) 스님으로 있던 중에,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삼춘(三春)에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노라.”고 하면서, 다시 오대산(五臺山) 상원사의 조실로 들어갔다. 그 후 27년 동안 그는 동구 밖에 나오지 않은 채, 76세의 나이로 일생을 거기서 마쳤다. 그때 그의 법랍(法臘 : 출가한 해부터 세는 나이)은 54세였다. 그는 오대산에 처음 들어올 때 소지했던 단풍나무 지팡이를 중대(中臺) 뜰 앞에 꽂았다. 일영(日影)을 재어보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꽂힌 자리에서 잎사귀와 가지가 돋아 나와서 하나의 훌륭한 정자나무가 되었다. 지금 오대산 중대 앞에 있는 정자나무가 바로 스님의 지팡이였다고 한다.
오대산에 머물며
스님은 경봉스님 등 당대의 고승들과 많은 서신을 왕래하며 법을 논하였고, 『불교』, 『선원』 등 여러 잡지에 글을 투고하여 올바른
교학과 수행을 정립하는데 힘을 쏟았다. 그러나 세상은 스님에게 교학과 수행의 정립에만 힘쓰도록 버려두지 않았다.
1926년에 스님은 오대산 상원사에서 「승가오칙(僧家五則)」을 제정하여 선포하였다. ‘승가오칙(僧家五則)’은 수행과 일상생활이 일체화된 수행규범으로 참선, 간경, 염불, 의식, 가람수호의 다섯 가지로서 참다운 수행자를
양성하고 승가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뜻을 둔 것이었다.
1928년 초반 1920년대 전반기 불교청년운동의 주역들이 서울에 집결하면서 점차 한국불교의 모순을 개혁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당시 불교청년, 청년승려들은 한국불교의 근본적인 개혁을 기하기
위해서는 불교계의 자율적인 통제의 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당시 불교계는 일제가 정한 사찰령에 의해
식민지 불교체제의 구도에 구속되면서, 그 내적으로는 사법의 틀 아래서만 운용되었기에 불교계 전체의 차원에서는 일체의 규율, 내규 등이 부재하였다. 이에 그 정황은 31본산이 군웅할거 하는 봉건체제와 흡사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청년승려들은 그 대안을 불교계의 자율적인 운용의 틀인 종헌의 제정으로 표현하였던 것이다. 즉 종헌제정을 통하여 불교계 운용의 기틀을
만들고, 그 후에는 그 종헌에 의거 교단을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즉 불교계 통일운동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나온 것이 1929년 1월 3~5일, 각황사(지금의
조계사)에서 개최된 조선불교 선교양종 승려대회였다. 당시 그 대회는 전국 각처에 있었던 불교계
대표 107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대회의 결과 스님은 7명의 ‘교정(敎正, 오늘날의 종정) 중에 한 분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이 체제는 1932년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행되었지만 1934년에 접어들면서 종헌체제는 거의 종말을 고하였다. 이에 방한암의 교정으로서의 활동은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하였다.
스님은 다시 1935년 초반에 등장한 선리참구원, 전국 선원, 수좌들이 주도한 조선불교 선종(禪宗)의 종정으로 추대되었다. 활동의 실제나, 종정직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어 더 이상의 내용은 추론키 어렵지만, 1930년대 중반에도 수좌들 사이에서는 방한암의 수행력, 위상,학식 등이 분명하게 각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조선불교 선종의 종정으로 추대된 3인 승려중, 1929년 승려대회에서 선출된 교정은 방한암이 유일하다. 이처럼 방한암을 선종을 내세운 수좌들이 종정으로
추대하였다는 것에서 그의 실참실수에 대한 수행력, 선사상의 깊이와 함께 당시 불교계에서 일정한 영향력과 위상을 점하고 있었던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종정으로 추대된 바 있으나 스님이 종정직을 수락하거나 종정으로서의 활동을 하신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다만 김광식의 지적처럼, 이 두 차례의 종정직 선출은 조선의 수행자들에게 한암 스님이 어떠한 영향력과 이미지를 비춰지고 있었는지를 확연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오히려 스님은 1936년에는 상원사에 강원도 3본산(유점사ㆍ건봉사ㆍ월정사) 연합승려수련소를 설치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