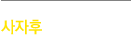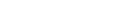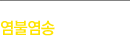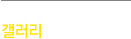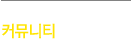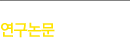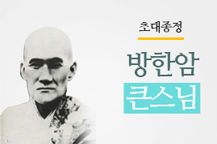[월정사 역사와문화] - 1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 관리자 작성일14-02-07 17:16 조회5,009회 댓글0건본문
Ⅲ. 조선시대; 질곡을 넘어 역사와 신앙을 품었던 불교성지
4. 조선후기의 소실과 중건
월정사가 임진왜란 이후 사고가 설치되면서 수호총섭사찰이 되었다고 하지만, 곧바로 그 성세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임진왜란의 여파가
적지 않았던 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병자호란이 닥쳤기 때문이다. 사고를 설치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기록 중에는 그 동향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조정에서는 특별히 지시를 내려 오대산에 있는 사고를
지키는 승려의 전례에 따라 이곳 승려들의 제반 부역을 일체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라는 1630년(인조 8) 수직승(守直僧)들의 신역 및 잡역을 면제하게 하고 능역(陵役)도 차출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아 사고 설치 후에도 수직승들에게는 신역 및 잡역이 면제되었음을 알 수있다.
그런데 1644년(인조 22)에
이르러 각해(覺海)가 상원사 전각이 퇴락하자 대대적인 보수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우리나라 동쪽의 산수는 천하에 으뜸이며, 관동이 그 중 가장 아름다운데 오대산은 관동의 신비로운 경계에 있다. 상원사는
오대산의 명찰이며, 신비하고 기이한 자취가 예로부터 나타났으니 세조대왕 때에 처음 큰 결실을 맺었다. 임금이 친히 거둥하여 절을 더욱 빛나게 하고 괴애 김공(김수온,1410~1481)이 그 일을 기록하였으니 선가에서는 이에 어찌 귀한 인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불사가 이루어진 이래로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서 기둥과 서까래가
기울어져 무너지고 황금색과 푸른 색의 아름다운 색채가 뭉개지어 분명하지 않아서 날개를 치고 나는 새같이 아름다움이 점점 변하여 고승[龍象]이 갈마들어 차탄하더니 각해(覺海) 상인이라는 분이 있어 분개하며 한탄하여 떨치고 일어나 마침내 옛 사찰을
일으켜 세움을 자기의 임무로 삼고서 계책을 떨치고 잔을 띄우고 험한 산을 능멸하여 넘고 깊은 물을 건너서 먹고,
가까운 곳을 두루 돌아다닌 것이 겨우 7개월의 보시가 남음이 있음을 고하고 풍근이 비로서
운전하고 승려가 구름처럼 모여서 목수의 일이 날로 이루어져 두 번 봄을 지내서 끝내니 갑신년(1644, 인조 22)이다.
기울어지는 것을 바로 일으켜 세웠으니 아름답고 거룩한 일이지만 그 무리들이
어찌 빈터에 새롭게 불사를 일구었겠는가. 높고 크며 빼어나게 아름다운 법당은 날아 갈 듯 하며, 선당과 승당은 성대하여 구름에 덮이고 노을이 드리웠다. 동서 양쪽의
상실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인 듯 같아 보이는데 스님들과 문사들이 어울려 해돋이와 달맞이를 하는 요사(寮舍)이고, 종소리와 북소리, 염불소리 그윽한 당우와 욕실(湢浴) 그리고 포주(庖廚)가 있다. 수각(水閣)은 모든 사문들이 매일 사용하는 것이어서 쓰러지지 않도록 갖추어 이번 여름에 물을 채웠다. 열 네 채의 전각은 단청이 밝게 빛나고, 일곱부처님은 황금으로 다시
칠했으니 모두 각해상인의 공이로다.
또 반현(班玄) 납자가 있는데 그가 이어서 나한전과 해회당(海會堂)을 차례로 중수하며 손보고 있으니 이는 장차 병술년(1646) 봄에
낙성할 것이다. 그때 나를 불러 한마디 하라고 하면 마땅히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보건대, 유학(儒學)으로 노자(老子)를 꿰고, 노자로써 유학을
꿰어 굳건하게 하는 것이니, 어찌 공자(孔子)를 읽고 부처님을 위해 말하지 않겠는가. 문득 나 홀로 이곳에 감흥이 있으니 어찌 그것을 억누르랴. 나는
오대산이 높고 높아 하늘에 닿으며 세상과는 떨어진 외딴 곳이라고 들었다. 이에 나라의 역사인 비보첩(祕寶牒)을 우산(禺山)에 감추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서대 아래에 우통수가 있는데 이 물이 흘러 한강이 되어 우리 왕기(王畿)의 밑바탕이 되고, 더불어
마치 빗장을 건 것처럼 맑은 물이 띠를 이루어 강 가운데로 흐르니 그 울타리는 우리나라에 큰 이익이다. 어찌
구름 밖으로 우뚝 솟은 봉우리에 더하여 또 다른 봉우리가 있겠는가. 다만 아름다운 경승을 홀로 차지하여
세상 밖의 다른 것과 견주지 않을 뿐이라네. 신라의 두 왕자가 이곳에 몸을 숨긴 일이 있으니 이야말로
장부로다.
생각건대 우리 세조대왕 때에 가람을 창건하였으니 이 또한 우연이 아니다. 선승과 시승들이 서로 더불어 새롭게 몸을 닦고 보살폈으니 그 마음과 더불어 절 또한 다 같이 새롭게 된 것이리라. 불·보살이 대자대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고행의 바다로 노를 저어
나가는 것이다. 어두운 갈림길에 낀 안개의 미혹을 깨쳐 세상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옳은 일이다. 덕이 하늘과 같이 높아서 나라의 운명이 오래도록 이어지고, 대를 이어 그러한 뜻 변치 않아 무릇 만겁이 되기를 기원한다. 산하가
떠받치고 호위하며 운물(雲物, 해무리)이 음호(陰護)하는 이 절이야말로 앞으로도 오대와 더불어 시작과 끝을 같이 하리라.
뒷날, 혹시 각건(角巾)에 초야의 옷을 입고 동쪽으로 유람할 일 있으면, 상원사 빈 방에 기대어
오대산의 상쾌한 기운 들이 마시며 동해의 해와 달 돋는 광경 침상에서 보리라. 그런 후에 마땅히 하늘
높은 곳에서 내린 이슬로 나의 붓을 적셔 이 글을 씻고 새롭게 쓰리라.
<이경석(李景奭)이 지은 「상원사중수기(上院寺重修記)」(『백헌집(白軒集』 권31)>
이경석(李景奭,
1595~1671)이 지은 「상원사중수기」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각해는 상원사의 법당, 선당, 승당, 동서의 상실(上室)과 별관(別觀), 연사(蓮社)·빈일(賓日)·요월(邀月)의 요사(寮舍), 종각, 수각(水閣) 등 14개의 전각을 중수하고 단청하고
7구의 불상을 개금하였다. 그리고 승려 반현(班玄)이 1646년(인조 24) 상원사의 나한전과 해회당(海會堂)을 보수하여 봄 낙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중대에 수운암을
새롭게 건립하였다는 기록 역시 남아 있다.
암자(庵子)의 이름을 수운(峀雲)이라고 한 것은 실제의 경물(景物)을 기록한 것이다. 암자는
지현(砥峴)의 대산(大山) 안에 있는데, 위치하고 있는
그 땅이 높고도 그윽하다. 골짜기 아래에서 쳐다보면 항상 구름 기운이 무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암자 속에 앉아서 내려다보면 뭇 산봉우리들이 고리처럼 에워싸고 있어서 냇물이나 평지가 모두 숨겨진 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아침저녁으로 구름과 안개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휘돌아 감싸고 있는 모습들이
모두 보기에 멋들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 이름을 내걸게 된 것이다.
이 암자에 승려들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부처를 받드는 뜻을 취하지 않은
것은, 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뜻을 이끌어 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암자가 분산(墳山)의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선조를 받드는 뜻을 취하지 않은 것은, 승려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오로지 그러한 의미만 부여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고려(高麗) 때에는 재(齋)를 올려서 죽은 사람을 천도(薦度)하는 풍속이 있었으니, 이른바
원당(願堂)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것이 없는데도 여전히 과거의 풍습을 따라 그렇게 칭한다면, 후대의 의심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 나는 이 암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회옹(晦翁, 주희의 호임)의 한천정사(寒泉精舍)의 뜻을 취하는 동시에 도령(陶令)의 여사(廬社)의 정취를 부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귀거래사(歸去來辭)’ 가운데 나오는 자구(字句)를 뽑아 이 암자의 이름을 붙였으니,
이렇게 보면 또 실제의 경물(景物)만을 취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아, 병란(兵亂)이 일어난 이래로 노역(勞役)이 번거로워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승속(僧俗) 모두가 고통을 당하였다. 그리고 나 역시 너무나도 빈약(貧弱)한 나머지 묘호(墓戶)를 보유하지도 못했으니, 이
암자 하나가 그야말로 이 산을 밖에서 보호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겠다. 그런데 암자에 거주하는
승려들의 입장에서도 암자가 바로 이 산속에 있기 때문에 노역에 응해야 하는 다른 사찰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편히 앉아서 초연하게 지낼 수가 있다. 그러고 보면 이 산과 이 암자가 서로들 도와주는 관계에 있으니, 이
또한 상호간에 보답하며 베풀어 주는 도리를 행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구름이
산에서 나와서 산의 모습을 장식해 주면서도 어디까지나 무심하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만물을 윤택하게 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산과 암자의 관계에 비유해 보아도 좋을 것이니, 그저 산과
암자가 자연스러운 이법(理法)에 따라서 서로들 유익하게 해 주면 그뿐이요, 뭔가 의식적인 마음을 굳이 가지고서 보답을 바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산의 이름은 마산(馬山)이요, 골짜기의 이름은 백아(白鵶)인데, 이는 본래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다. 그런데 내가 당초에 술인(術人)의 말을들어 보건대, 이
산이 바로 오대산(五臺山)의 중맥(中脈})에 해당되는 만큼 중대(中臺)라고 명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지금은 이를 따르려 한다.
만력(萬曆) 계축년(1613, 광해군 5)에 내가 선묘(先墓)의 터를 골짜기 안에 처음 잡으면서 암자의 터도 그때 함께 봐 두었는데, 암자를 세울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다. 그러다가 22년이 지난 갑술년(1634, 인조 12)에 승려 지해(志海) 등이 처음으로 여기에다 초막을 짓고 거처하였으며, 그로부터 5년 뒤인 무인년(1638,
인조 16)에는 내가 선비(先妣)의 상을 당해 묘소 아래에서 여막(廬幕)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때
비로소 지해와 철회(哲會)에게 일을 맡겨 공사를 주관하게 하였으며, 그 뒤에는 또 묘신(玅信)이라는 자가 이 일을 이어 나갔다. 이렇게
해서 암자의 이름이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먼 곳에서부터 찾아와서 여기에 머무는 승려들도
있게 되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을유년(1645, 인조 23)에 산불이 일어나는 바람에 여러 승려들의 소지품까지도 모조리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이에 윤선(允禪) 비구(比丘)가 앞장서서 중건(重建)을 도모하여 여러 선숙(禪宿)들과 함께 서원(誓願)을 세우고 뜻을 모은 뒤에 옛터를 넓혀 새로이 확장하는 공사를 벌이기
시작하였는데, 일 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날아갈듯한 기와지붕이 우뚝세워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협실(夾室)과 전헌(前軒)이 더해졌음은 물론이요, 주방(廚房)과 곳간까지도 모두 갖추어진 가운데 도합 20여 칸의 암자가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또 보안(普眼) 비구가 치장하는 일을 주관하여 마무리를 지었다. 이에 비로소 암자의 편액(扁額)을 내걸게 되었으므로, 그
시말(始末)을 서술하는 동시에 이 일을 도와 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의 성명을 뒤에
기록하게 되었다.
아, 오늘날 세상이 온통
어렵고 황폐해진 가운데 나 역시 힘이 빈약하기만하니, 여러 비구들의 신심(信心)과 원력(願力)이 없었던들, 어떻게 이처럼
속히 이 일을 끝낼 수가 있었겠는가. 생각하면 이 일이 또한 기이하다고도 하겠다.
성상(聖}上) 24년 병술에 덕수(德水) 후인(後人) 택당 이식 여고보(汝固父)는 쓰다.
<『澤堂先生別集』13, 「수운암(峀雲庵)에 대한 기문(記文)」 >
이것은 양란이 발생한 후 중대에 새롭게 수운암을 건립하게 된 내력을
기록한 것이다. 화재로 소실된 암자를 재건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병란 이후 사원을 중건하기조차 버거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란 직후인 만큼 오히려 당연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해소되는 17세기말 숙종 대에 이르러서였다.
이보다 좀 늦은 시기의
오대산에 대한 기록으로 미수 허목(眉叟 許穆,1595~1682)의 것이 있다. 허목의 오대산에
대한 기록은 아마도 삼척부사로 좌천당했던 시절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660년대 무렵으로 추정된다.
한계령 동쪽은 설악이고, 설악의
남쪽은 오대이다. 산은 높고 크며 또 깊고멀다. 산의 기가
가장 많이 쌓인 곳은 다섯 군데인데 이를 일컬어 오대라한다. 가장 북쪽은 상왕산(象王山)이며, 높고 험준하기가 이를 데 없으며 최고 봉우리는 비로봉(毗盧峯)이다. 동쪽의 두 번째 봉우리는 북대라 하고 감로정(甘露井)이 있다. 비로봉의 남쪽에는 지로봉(地爐峯)이 있으며, 지로봉 위는
중대이다. 산은 깊고 맑은 정기가 가득해 새조차 이르지 않는다.
불자들은 이곳에서 새벽에 상(像) 없는 부처에게 예를 올리는데 이곳이 가장 뛰어난 곳이다. 중대 바로아래 사자암이 있는데 태상신무왕(太上神武王)이 지은 것이다. 참찬 문하
권근에게 명하여 사자암기를 지었다. 옥정(玉井)이 있어 아래로 흘러 옥계(玉溪)가 된다. 북대의 동남쪽은
만월(滿月)이 되고, 그 북쪽이 설악이며
만월의 절정은 동대이다. 동대의 물은 청계(靑溪)가되고 동대에 오르면 붉은 바다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상왕봉의 서남쪽은 장령(長嶺)이 되고 그 위는 서대가 된다. 서대에서
신비한 우물을 길으니 그것을 우통수(于筒水)라 하는데 이는 한송정(寒松亭)의 선정(仙井, 강릉 북쪽 15리, 한송정 옆에 있었던 찻물 샘)과 더불어 신령스런 샘으로 불린다. 장령의 동남쪽은 기린봉(麒麟峯)이고 그 위는 남대이다. 그
남쪽 기슭에는 영감사가 있는데 여기에 사서(史書)가 보관되어 있다.
상원사는 지로봉 남쪽 기슭에 있는데,
산중의 아름다운 절이다. 동쪽 모퉁이에 큰 나무가 있는데 줄기와 가지가 붉으며 잎은 전나무와
같다. 서리가 내리면 잎은 시들어 떨어지는데 늙은 삼나무라고도 하며 비파나무라고도 한다. 상원사를 유람한 후 중대에 오르기까지가 5리 이고, 또 북대에 오르기까지가 5리 이다.
서쪽으로 장령봉에 오르기까지가 10리이고, 또
남쪽으로 10리를 가면 월정사다. 월정사 위쪽에 관음암이
있는데, 서쪽으로 종봉암(鐘峯庵)과 마주 대하여 굽어보고 있다. 종봉은
장령봉 서남쪽에 위치한다. 이상은 그 중 가장 큰 봉우리들을 들어서 기록한 것이다. 산이 대체로 흙이 많고 바위가 적으며, 늙은 전나무가 많다. 산 중의 물은 합류하여 큰 내를 이루어 남대의 동쪽 골짜기에 이르러 반야연(般若淵)이 되고, 월정사 밑에 이르러
금강연(金剛淵)이 된다.
<허목의 『기언(記言)』 「오대산기」>
미수 허목이 오대산을 들렀을 무렵에는 이미 전쟁의 상처가 많이 가신
시점이었기 때문인지 안정된 오대산 사찰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곧 17세기 후반의 오대산 불교는 전쟁의 상흔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것은 물론 오늘날에 보는 오대산의 형세와 비슷한
형세를 보여준다. 특히 허목의 기록은 오대와 각각의 형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원사와 영감사(史庫寺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