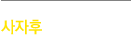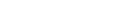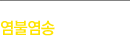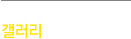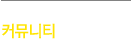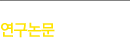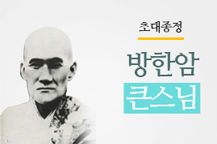[월정사 역사와문화] - 1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 관리자 작성일14-02-06 11:03 조회4,878회 댓글0건본문
Ⅲ. 조선시대; 질곡을 넘어 역사와 신앙을 품었던 불교성지
3. 조선중기 사명당의 월정사 중건과 오대산사고(五臺山史庫)의 설치
조선중기에는 청허휴정과 그 문도들이 대거 월정사 및 오대산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조선 중기에 청허휴정과 문도, 특히 사명유정 등과
부휴선수의 문도 벽암각성 등에 의해 오대산 불교가 주도되기에 이른다. 청허휴정(1520∼1604)은 오대산에 주석하였다. 『청허당집』에 등장하는
요의장로와 학일도 역시 오대산에 머물렀다. 일학(一學) 장로는 휴정의 스승인 듯 하며,
1512년(중종 7) 여름 무렵 오대산에서 지냈으며, 요의(了義) 장로는 오대산 진여암(眞如庵)에 주석한 바 있다. 그리고
휴정의 문도들도 오대산에 많이 주석하였다. 사명유정(泗溟惟政,
1544~1610), 영허해일(映虛海日,1541~1609), 제월경헌(霽月敬軒,
1542~1632) 등이다. 특히 사명유정이 오대산 영감암에 주석하였다. 유정은 1546년(명종 1) 가을부터
반 년 간 오대산에서 머물렀었고, 1587년 무렵 월정사와 영감암[靈鑑蘭若]에 머물면서1589년 월정사를
중건하였다. 금강산을 내왕하면서 일찍이 오대산을 자주 찾았던 유정은 오대산에서 많이 퇴락해 있었던 월정사를
중건하기 위해 발원을 하여 1587년부터 3년 동안 각지를
유력하면서 권선하였다. 5년간 중건 끝에 1589년 늦봄
법당을 중창하고, 그 이듬해 1590년 단오절에 낙성식을
올렸다. 「월정사 법당 개연소문(月精寺法堂開椽疏文)」은 그 자세한 사정을 알려준다.
제자 아무개(某)가 아룁니다.
본래 이 법계 가운데 하나의 물거품으로서 4생(四生) 속에서 났다 죽었다 하다가, 마침
조그만 선(善)을 지음으로써 호서(湖西)에 태어났습니다. 젊어서
머리 깎고 늙어서 돌아다닐 때 이곳을 지나다가 옛일을 살펴봄에 지금의 광경이 너무나 처참하여 8백 년
동안의 유적을 수습하여 드디어 중창할 뜻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정해년(1587) 여름에 권선문(勸善文)을 소매속에 넣어 돌아다녔고, 기축년(1589) 봄에는 법당을 고치고 서까래와 마루를 올렸으며, 그해 여름에
잇달아 범종루의 서까래와 마루를 만들었습니다. 월정사는 천지가 개벽한 뒤로 지금까지 신선이 사는 곳이요, 망한 당나라와 흥한 송나라에서도 모두 참선하는 절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 대들보와 마루가 꺾여 바라보는 승도가 우러러 보는 속인들은 그 눈에서 눈물이 흘렀으며, 비가
들이치고 바람이 때리니, 부처님 얼굴에는 이끼가 푸르렀습니다.
그리하여 제자 아무개는 말을 내었으나 길이 없음을 깨달았고 공을 세우려면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한 끝에 5년 동안 권선문을 가지고 천하를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연기 낀 마을과 비오는 읍내에서는 알아주는 이가 적어 한탄하였고, 가을밤
달과 봄바람 앞에서는 세월의 빠름을 안타깝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 치의 베와
세 움큼의 곡식을 거두어 모아 기축년 늦봄에 법당을 고쳐 새로 수리하고, 경인년(1590) 단오를 맞아 낙성회를 열었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는 풀을
맺는 간단한 일에 지나지 않으나, 그 공에 있어서는 하늘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냇가에서 나는 차나 궁궁이풀은 비록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정성을 들이고 목욕재계한 것은 부처님께 올릴만한
것입니다.
<『사명대사집』 권6. 동국역경원, 1970>
이와 같이 16세기말의 월정사는
법당이 퇴락하여 비가 들이치고 부처님의 얼굴에 이끼가 맺힐 정도였다. 왕실의 적극 지원을 받았던 대찰조차도
불교 탄압의 흐름을 마냥 비켜갈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실상 월정사와 오대산 불교는 조선 왕실과의 인연
때문에 조선전기에 가장 많은 중창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찰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쇠락했다는 것은 불교 탄압의 정도를 알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증좌가 된다.
대사는 비통한 심정으로 중창의 발원을 세우고 1587년부터 3년 동안 각지를 유력하면서 권선을 시작하였다. 한 치의 베와 세 움큼의 곡식이라도 정성껏 모아 마침내 1589년
늦봄 법당을 새로 꾸미고 이듬해 단오절에 낙성식을 올렸다. 기둥을 세우고 서까래를 올리는 힘든 불사였지만, 대사는 3km나 떨어진 영감난야(靈鑑蘭若)에 머물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사를 지휘하였다. 1589년 늦봄에 법당이 완성되었지만 낙성식은 1년이 지난 1590년 단오날에 열렸다. 그 이유는 어이없는 역모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1589년 정여립(鄭汝立, 1546~1589년)이 대동계(大同契)를 조직하여 역모를 꾀한다는 고발이 있었는데, 누군가의 거짓 진술로
대사는스승 서산대사와 함께 강릉부에 투옥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다행히 무고로 밝혀져 풀려나게 되었다. 이 사건 때문에 월정사 법당의 낙성식이 1년 뒤에 열렸던 것이다. 이와 같이 험난한 역경을 딛고 월정사는 사명대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다시 여법하게 법등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대사는 중수를 마치고 금강산으로 들어갔다.
이보다 10년 늦은 1599년(선조 32) 승려
지운(智雲)과 보명(普明) 등이 주도하여 문수동자상 2구와
나한상 16구 등에 금칠을 새로 하고 고쳤는데, 이때는 일학(一學)이 증명법사로 화사(畵師)로 석준(釋俊)· 원오(元悟), 지전(持殿, 불전을 주관하는 스님)으로
계순(戒淳) 공양주(供養主)로 학현(學寶) 등이참여하였다. 발문은 학명이
지었는데, 중수한 탱화 중에는 달마대사의 영정과 나옹화상의 영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조선전기에서 중기에 이르는 오대산 불교에 미친 나옹화상의 영향을 보여준다.
이렇듯 휴정의 스승으로
추정되는 일학장로가 상원사의 중수에 증명법사로 나서고, 휴정의 제자인 사명유정이 월정사를 중건하는 등, 조선중기의 오대산 불교는 청허계 문도들의 주요한 활동 근거지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사명유정은 월정사에 대한 인연이 많았던 듯,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후 대사가 평화 교섭차
일본에 건너갔을 때도 오대산을 그리는 시를 짓고 있다.
나그네
노릇 해가 지나 시 더욱 읊조리니,
오대산
동림(東林)에 문 닫고 누웠던 일 자주 생각난다.
푸른
솔 방장실로 돌아갈 마음 있는데 푸른 하늘 저문 구름 먼 생각나누나.
혜초[蕙] 장막에 향을 피울 때 산이 어두워지고 학소리에 꿈
놀라니 달은 처음 젖었네.
다시
성수(聖}壽)의 천추를
빌던 일 생각하니,
완하(浣河)에 비 지나매 봄물이 깊었도다.
이 시는 평화 교섭의 막중한 임무로 바쁜 나날을 보내다가 고국을 생각하면서
오대산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그런 사명유정이 다시 오대산으로 돌아온 것은 1605년 6월이었다. 그리고 1606년 4월, 조정에서는
오대산의 영감사에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는 오대산 사고(史庫)를 건립하였다. 건립 공사는
강원감사가 맡았으나 대사가 일찍이 이곳에 머물며 월정사를 중건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당시 선조가 대사에게 제반 공사를 맡겼던 것 같다. 사고의 설치 이후 월정사의 주지는 사고의 수호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되었다. 곧
오대산 사고 실록을 수호하는 총섭은 월정사의 주지였으며, 그 암자인 영감사(靈鑑寺)로 하여금 수호하게 하였다. 설치 당시 수호군(守護軍) 60명, 승군(僧軍) 20명이 수직(守直)하였다. 그리하여 임진왜란기
사명유정에 의한 월정사 중건과 실록 사고(史庫) 총섭사찰의 유지는 여말선초 나옹과 문도들, 세조대 삼화상 신미와 두 제자 학열 학조에 이어, 조선후기 오대산
불교가 국가와 왕실 사찰로서 위상을 지니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동하게 되었다. 실록의 봉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실록』에서 찾아진다. 선조 39년 병오(1606,만력 34), 4월 28일자에
실록인출청에서 실록을 완성하고 난 뒤에 올린 건의의 내용이다.
“선왕조의 『실록』을 이제 이미 교정을 끝냈고 개보(改補)도 마무리지었습니다. 구건(舊件)은 모두 5백 76권인데, 이번 새로 인출한 것은
4∼5권을 합쳐 1책으로 하기도 하고 2∼3권을 1책으로 합치기도 했으므로 신건(新件)은 모두 2백 59권입니다. 따라서 신건과 구건을 통틀어 5건으로 계산하면 거의 1천 5백여
권이나 됩니다.
선왕의 비사(秘史)는 사체가 지엄한데, 허다한
권질(卷秩)을 한 곳에 합쳐 둔다는 것은 지극히 미안한 일이니, 외방의 사고에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하루가 시급합니다. 그런데 강화의
사각(史閣)은 작년에 이미 수축했고, 태백산·오대산·묘향산 등처의 사각도 거의 공사가 끝나가고 있다고 들은 듯합니다. 관상감으로 하여금 봉안할 길일을 간택하여 계품하게 한 뒤에 외방의 경우는 실록청 당상 및 사관을 파견하여 배봉(陪奉)하게 하되 장마가 지기 전에 급히 서둘러 봉안토록 하고, 서울의 경우는
춘추관을 수축할 때 까지는 우선 병조에 봉안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또 서울과 외방에서 수직하는
절목에 대해서는 예조로 하여금 춘추관과 회동하여 상의해 처치토록 함으로써 허술하게 되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또한 온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종조의 실록 도합 13책 가운데 첫 권과 9권은 두 권씩있는 반면 제11권은 없습니다. 이는 필시 당초 나누어 보관할 때 살피지못한 결과로서 지극히 온당치 못한 일이나,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근래 국가에서 일으킨 공역(工役) 중에서도 이번의 역사(役事)가 가장 거창했으며, 공정(工程) 역시 착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국(局)을 개설한 이래 4년이 다
되도록 각색(各色)의 장역(匠役) 및 해리(該吏) 등이 날마다 입역(立役)하면서 새벽에 나와 저녁에 돌아가는 등 한 시각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대역사를 다행히도 아무 탈 없이 완료하게 되었으니, 노고에
보답하는 상전(賞典)을 특별히 베푸는 것이 마땅할 듯싶습니다. 황공하게도 감히 아룁니다.”
1606년의 기록인데, 근래 국가에서
일으킨 역사 중에 가장 거창했으며, 그 수직절목에도 폐단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건의하고 있다. 사고의 재정비는 아마도 임진왜란 후 조선 왕실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이것은 사고 전체에 실록을 봉안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지만, 조선
왕실의 사고 설치에 대한 엄중한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대산 역시 조선 왕실에서 중히 여기는 사고가
설치됨에 따라 그 입지가 달라졌을 것은 명연하다.
이와 더불어 5대 적멸보궁 가운데 월정사가 수호총섭사찰이 되게 하였던 사실도 오대산 불교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한 몫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는 1620년(광해군 12) 적멸보궁을 수호하는 밀부(密符)가 하사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다. 현재도 월정사 소장되어 있는 밀부에 “江原 道 五臺山 中臺 寂滅寶宮 守護禪敎八道釋品第一 都院長密符者 禮曹判下 庚申丁月日 國幸敎是 上言內 新鑄給信圖”라는 글귀가 바로 그것이다.
【오대산사고(五臺山史庫)】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에서부터 조선 철종 때까지 25대 472년간(1392∼1863)의 역사를 기록, 1,893권 888책으로 만든 방대한 역사서로 현재 한국 국보 151호이자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기록유산이다.
오대산
사고(史庫)는 조선 후기 오대 사고의 하나인 외사고로 오대산
사고가 설치된 것은 1606년(선조 39년) 이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1605년 10월 재인쇄된 실록의 초고본을 봉안할
장소로 오대산 상원사를 선정하였다가, 다시 월정사 부근에 사각(史閣)을 건립하여
초고본 실록을 보관하였다. 오대산 사고의 수호사찰인 월정사는 사고에서 너무 떨어져 있으므로 실제로는
암자격인 영감사에서 수호하였다. 오대산 사고 실록을 수호하는 총섭은 월정사의 주지였다. 설치시 수호군(守護軍)
60명, 승군(僧軍)
20명이 수직(守直) 하였다. 선조 36년(1603) 7월부터
동왕(同王) 39년(1606) 3월
사이 유일한 현존본인 전주사고본을 모본(母本)으로
하여 복인(復印)하고, 오대산
사고에 초본 혹은 방본(傍本)이라고
하는 교정쇄를 보관시켰다. 그 이후 실록이 간행되는 대로 계속해서 오대산사고에 봉안(奉安)하였는데, 조선
태조부터 『철종실록(哲宗實錄)』까지, 곧 선조 39년 이후 1910년
일제강점시까지의 기록이 계속 오대산사고(五臺山史庫)에 봉안되어
왔다. 1909년 조선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오대산 사고에는 철종까지의 실록 761책, 의궤 380책, 기타 서책 2,469책 모두
3,610책이 보관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의 조선 강점 이후에 오대산 사고의 서책은
이왕직(李王職) 도서관에서 관리하였으나, 1914년 조선총독 테라우찌(寺內)에 의하여, 오대산 사고본일체가 일본 도쿄대학으로 불법으로 반출되었다. 실록은
일본으로 건너간 뒤, 관동대지진으로 거의 소실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행히 당시 대출되었던 책들이 화를 면하였고, 도쿄대학은 그중 27책을 1932년 5월 당시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
현재 서울대학교)으로 돌려주어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圖書)에 보존되고 있었고, 나머지 수습된 서적은 최근까지 도쿄대 도서관 귀중본 서고에 계속 남아있었다.
2006년 3월 3일, 일본이 강탈해간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을 환수하기 위하여 봉선사와 월정사 주지스님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조선 왕조실록 환수위원회’(환수위)가
공식 출범하였다. 환수위는 출범식과 기자회견을 마치고, 일본대사관을
방문하여, 고이즈미 일본총리를 수신인으로 하는 ‘조선왕조실록
반환요청서’를 공식 전달했다.
이후 3차에 걸친 회담 끝에, 5월 31일
도쿄대 도서관장은 ‘서울대학교의 창립 60주년과 규장각 창립 230주년을 축하하고, 도쿄대학과 서울대학교의 학술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도쿄대학이 소장한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을 서울대로 기증하기로 결정했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환수위에 전달하였다.
도쿄대가
서울대로 기증사실을 발표하자, 사회일각에서는 ‘일본의 양심세력에
감사한다’는 흐름이 있었고, 오히려 반환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환수위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시각도 있었다. 환수위는 일단 도쿄대를 문화재 약탈자에서 선의의
기증자로 탈바꿈 시켜준 서울대학교를 비판했고, 약탈자가 소장처를 결정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서울대 규장각 소장을 반대하였다. 그리고 국립고궁박물관, 독립기념관, 오대산사고 중 역사적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 곳에국민적 합의를 거쳐 소장처를 결정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문화재청에
통보했다.
실록의
소장처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대산 월정사는 실록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상태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