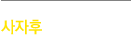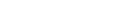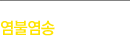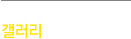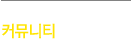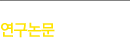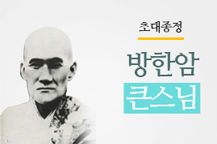산(山)의 인문학 - 계룡산(산과 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 관리자 작성일14-08-27 11:24 조회5,810회 댓글0건본문
※ 계룡산(산과 용)
ㆍ새 시대를 꿈꾼 민중의 갈망, 용처럼 꿈틀대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함께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천재 예술가로
라파엘로(1483~1520)가 있다.
그의 작품 중에 독특한 이미지를 담은 그림이 눈에 띄는데
‘용을 무찌르는 성 미카엘(Saint Michel terrassant le
dragon)’이 그것이다.
이 그림은 성경의 요한묵시록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천사 미카엘이 창으로 용을 찔러 죽이는 모습을 재현했다.
용은 물리쳐야 할 사탄과 악마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묵시록에는 용의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한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었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아기를 해산하기만 하면 삼켜 버리려고
지켜 서 있었습니다.”
서양 사람에게 용은 우리가 생각해온 이미지와는
완전히 딴판이다. 서양의 용은 동양의 용과
모습에서 유사한 부분도 있으나,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악룡·독룡의 면모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용은 서양인에게 퇴치해야 할
적대적이고 난폭한 괴물이고
어둠이자 죽음이며
아직 어떤 형태를 획득하지 못한 모든 것의 상징이다.
코스모스라는 질서를 탄생시키기 위해
신들은 용을 정복해 토막 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반면 동아시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용을 수신으로 간주해 강우 또는 풍어를 기원하는
대상으로 삼았다.
상고시대에는 중국 역시 악룡, 독룡이라는 의미가 강했으나
긍정적으로 변화해 용신 또는 제왕 관념 등이 두드러진다.
한국 용 관념의 특징은
농경신으로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거나
재앙을 쫓고 복을 부른다는 생각이 어느 나라보다 강하다.
용에 의한 국가 수호나
미륵불 관념과의 복합 등도
한국만의 독자적인 특징으로 주목된다.
왜 동아시아에서, 특히 한국에서
용의 이미지는 좋게 나타날까?
용과 산, 서양과 동아시아의 인식 크게 달라
의문을 푸는 열쇠 중 하나는
용이 다름 아닌 산의 상징 이미지라는 해석이다.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의 무의식에 산천이 투사되어
이미지로 형상화된 것이 용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용꿈도 산천의 정기를
감응해 받는 꿈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용꿈을 크게 길하다고 여기지만
서양 사람들에게는 떨치고 싶은 악몽일 것이다.
우리와 달리 서양 미학에서는
산을 추하고 부정적인 것으로까지 여겼기 때문이다.
산은 ‘사악함’ ‘자연의 얼굴 위에 생긴 사마귀·혹·물집’으로
간주되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양에서는
산을 정복해 사람의 통제 아래 두고자 한다.
다시 묵시록에서 산을 은유하는 용 이미지의 단면을 보자.
“용은 강물 같은 물을 입에서 뿜어내어
여인을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마치 거친 황무지의 산에서 집중호우로
하천물이 갑자기 콸콸 불어나 사람들을 덮치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이렇듯 동서양의 용 관념의 차이는
동아시아와 서양의 산 지형과
그것이 사람에게 반영된 이미지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용이 산과 중첩되어 인식되는 현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산을 용에 은유하고
그것이 용산으로 산과 용이 일체화되어 인식된 현상도
특징적이다. 그래서 한국에는 수많은 ‘용산’ 계열의 이름이
하천 주위의 산에 나타난다.
용이 누워 있는 모습이라고 와룡산,
하늘에서 하강하는 모습 같다고 천룡산,
상서로운 기운을 품고 있다고 서룡산,
너그럽고 덕스럽다고 덕룡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용산을 지역별로 보면 중부 이남에 많으며
하천을 끼고 있는 산이 대부분이고,
산줄기 체계로는 백두대간, 장백정간보다
13개의 정맥에 주로 있다.
계룡산은 한국의 용산을 대표한다.
같은 이름은 거제, 순창, 남원 등지에도 있지만,
충남의 계룡산(847m)이 으뜸이다.
계룡산은 신라 때 오악 중 서악으로,
중사(中祀)의 제의를 했던 국가적인 명산이다.
조선시대에는 묘향산의 상악단,
지리산의 하악단과 함께 중악단으로서
나라에서 산신제를 올렸고
지금도 신원사에 그 유적이 남아 있다.
중악이라는 호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계룡산의 지리적 위치는 국토 가운데에 있다.
조선 초 수도의 강력한 후보지였다는
역사적 사건도 중요하다.
나라의 수도가 될 정도로 명산의 매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계룡산의 명산 이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선 후기에 민중의 산으로 대변되었다는 사실이다.
조선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정감록의 주 무대였던 것이다.
계룡산에서 정도령이라는 메시아가 나와
새 나라를 건설한다는 메시지가 민간에 퍼지면서
신도안을 중심으로 각종 도참비결파,
민족종교와 무속집단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한말 이후 계룡산은 한국 토속신앙의 메카가 되었다.
객관적 지형·주관적 이미지 결합된 이름
왜 산이름을 계룡산이라고 불렀을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고지명 분석이고,
또 하나는 무학대사와 관련된 풍수설화이다.
우선 고지명으로 풀어보면 계룡의 계는 닭의 한자 표기이고
닭은 달과 같은 말이다(닭의 알은 달걀로 표기된다).
그런데 ‘달’은 높은 산 혹은 언덕을 지칭하는 옛말이다.
그렇다면 계룡은 산과 용의 합성어일 수 있다.
객관적 지형(산)과 주관적 이미지(용)가 결합된 의미체인
것이다.
어떻게 산과 용의 합성이 가능했는지는
계룡산이라는 이름에 관해 전래되는 설화에도
실마리가 있다.
조선 초 이성계는 계룡산 신도안에 도읍을 정하려고
무학대사를 대동해 산세를 보았다.
무학대사가 산을 보더니 ‘금닭이 알을 품는 형국’(금계포란
형)이면서 ‘용이 날아서 하늘에 오르는 형국’(비룡승천형)
이라며 감탄했다.
그래서 계룡이 되었다는 것이다.
닭이든 용이든 모두 계룡산의 모양새를
동물에 비유한 표현이다.
이렇게 모양새로 산을 보는 방식은
풍수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전래의 용신앙과 풍수사상이 결합된 것이다.
풍수는 산을 용이라고 하고 용의 몸짓으로 동태를 본다.
인자수지 라는 풍수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산의 모양은 천만가지 형상이다. 크다가도 작고,
일어나다가도 엎드리고, 숨다가도 나타나며,
형체가 일정하지 않고 움직임도 다르니
만물 가운데 용이 그래서 용이라 이름 했다.”
흔히 계룡산의 형세를 일컬어
회룡고조(回龍顧祖·용이 휘돌다가 머리를 돌려 처음을 돌아
보는 형국)라는 것도 이런 시선이다.
산을 용으로 보게 되면서 바뀐
국토공간과 지리인식의 변화는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좌청룡 우백호가 그렇다.
삶터 왼편의 산은 생기발랄한 푸른 용이 된 것이다.
계룡산을 그린 고지도를 봐도 그렇다.
1872년 그린 연산현 지도에 계룡산은
해마를 연상시키는 용의 모습이다.
꿈틀거리면서 고을을 에워싸며 지키고 있는
용의 역동적인 모습과 함께 두 눈도 뚜렷하게 표현되었다.
무심한 흙덩이가 아닌 생명 충만한 유기체
이제 산은 용처럼 생명이 충만한 유기체로 변했다.
흙덩어리의 산이 생명의 산이 되었다.
산을 보는 시선과 해석의 패러다임이 확 바뀐 것이다.
산을 용으로 보니 용의 모습과 몸짓으로 보는 눈도 생겼다.
용의 머리라 용두산, 꼬리라 용미산이란 이름도 얻었고,
계룡산의 모습에서 용이 승천하는 형국이니 하는 인식도
생겼다.
강원도 오대산의 적멸보궁에
이런 흥미로운 용 이야기가 있다.
오대산의 산세에서 적멸보궁의 위치는
용의 머리라 하고 적멸보궁 옆의
맑은 물이 샘솟는 곳은 용의 눈에 해당해
용안수(龍眼水)라 불렀다.
그 옆에는 구멍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용의 콧구멍이라 한다.
낮에 이 구멍에 가랑잎을 가득 채워놓고
다음날 와 보면 다 날아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
밤새 용의 숨결에 의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다.
용으로 산을 보는 시선은 시간이 흐를수록 진화했다.
산은 용처럼 생기를 준다는 생각으로 더 나아갔다.
산에 기가 흐르고 맥을 이룬다는 것이다.
마치 한의학에서 사람의 몸에 기가 흐른다며
그 길을 경락이라고 하듯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