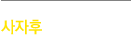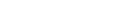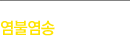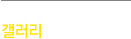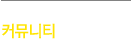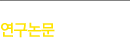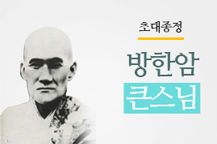우리산(山)의 인문학 - 임호산(林虎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 관리자 작성일14-12-10 15:54 조회5,224회 댓글0건본문
호랑이산의 생활사
ㆍ이 땅서 사라진 호랑이… 우리 삶엔 살아있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는 속담이 있듯 호랑이는 한국인들의 생활사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맹수다. 선사시대 유적인 반구대 암각화와 고조선 건국신화에서부터 호랑이가 등장하니 우리와 얼마나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는지 알 수 있다. 한국은 호랑이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에는 호랑이가 많았다. 궁궐이든 마을이든 전국 어디나 출몰해 호환을 당하는 일도 많았다. 곶감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 고양이처럼 귀엽고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한 ‘까치호랑이’ 민화를 보면 서민들이 얼마나 호랑이를 친근하게 생각했는지도 알 수 있다. 호랑이는 지킴이기도 했다. 맹호도나 호랑이발톱노리개 등은 병과 액운을 쫓는 기능으로 민간에서 쓰였다. 호랑이는 물리쳐야 할 대상이면서 사람을 수호하는 신성을 띠기도 했던 것이다.
■ 호랑이는 친근하면서도 두려운 대상
산신도에서 산신은 호랑이를 거느리고 있다. 호랑이를 산신으로 섬긴 토템의 흔적이다. 호랑이는 두렵고 사나운 상징이기에 예부터 신앙의 대상이었다. “호랑이에게 제사를 지내고 신으로 섬긴다.” <후한서> 동이전의 기록이다. 호랑이 신앙은 늦어도 고조선시대의 내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 백과사전인 <오주연문장전산고>에 “호랑이를 산군(山君)이라 하여 무당이 진산(鎭山)에서 도당제를 올렸다”는 서술로 보아 당시까지 호랑이 신앙이 이어져 내려왔음도 확인된다. 민간에서는 산신을 호랑이와 동일시했기에, 호랑이를 산신령 혹은 산왕대신(山王大神)으로 불렀다.
호랑이산신을 섬기게 된 데에는 전래의 화전생활사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화전은 고대적 농경방식이지만, “조선후기까지도 그 규모가 평전(平田)과 비슷했다”(<경세유표>)고 정약용이 말했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화전을 해서 먹고살았다. 일제강점기에는 토지조사사업 등으로 농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산간에 화전을 일구는 경우도 흔했다. 화전민들이 호랑이에게 입은 피해는 극심했던 것 같다. 호식총(虎食塚)이라는 독특한 장묘 풍습이 그 생활사의 흔적이다. 호랑이에게 당한 유해는 화장하여 그 자리에 돌무덤을 만든다. 그리고 시루를 엎어놓고 쇠젓가락을 꼽는다. 호식총의 분포는 전국적이나 백두대간의 태백산 권역에 집중되어 있다.
산촌 사람들이 호랑이의 피해를 막기 위해 가옥에 설치하는 호망(虎網)도 있었다. 굵은 밧줄로 망을 엮어 서까래에서 마당으로 늘어뜨려 그물을 치는 것이다. 또 산멕이라는 호환방지 신앙의례도 영동지역에 있었다. 주민들이 산에 들어가서 지내는 일종의 산신제다. 산멕이라는 말이 흥미롭다. 살아 있는 존재처럼 산에게 음식을 먹인다는 것이다. 음식을 대접하는 대상은 산신 혹은 호랑이였다. 강원 삼척의 일부 지역에서는 백호를 서낭신으로 모시기도 했다.
■ 화전생활 문화사에서 이어진 ‘신격화’
화등잔처럼 커다란 눈을 부라리고 있는 김홍도의 ‘송하맹호도(松下猛虎圖)’를 보면 머리털이 곤두설 정도로 사실적이다. 호랑이의 두려운 이미지는 산에도 투영되었다. 호랑이의 기세처럼 사나운 모습으로 바위가 곤두서 있는 돌투성이 산이나 호랑이가 쭈그려 앉아 있는 모양새의 산에는 호랑이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명으로는 호산, 호암산, 임호산 등 다양한 명칭들이 나온다. 경북 청도 대천리와 순지리에 걸쳐 있는 호산(해발 314m)은 형상이 호랑이 머리와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전남 영암 신북면과 나주 반남면 경계에 위치한 호산(156m)도 같은 이름이다. 바위산으로 호암산(虎巖山)은 서울 시흥, 경기 이천, 충남 부여, 전남 여수, 북한의 평강 등에 있다. 임호산(林虎山)은 경남 김해에 읍내를 마주하고 웅크리고 앉아 있다. 용호산(龍虎山)은 경남 통영과 경기 연천에 있다. 그 밖에도 호랑이산은 숱하게 많다.
이웃 중국과 일본에도 호랑이산이 있을까? 중국 강서성에 있는 용호산이 유명하다. 남쪽 봉우리는 용처럼, 북쪽 봉우리는 호랑이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란다. 산의 경치가 신비스러워 도교의 성지가 되었다.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었다. 그래서 호랑이산으로 비유되는 산은 있지만 우리처럼 생활사에 다가와 있는 산은 아니다.
풍수가 우리 땅에 적용되면서 호랑이산은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고 더 의미 있는 장소가 되었다. 한국 사람이라면 풍수는 몰라도 좌청룡 우백호는 알고 있다. 그 우백호가 호랑이다. 명당터에서 바라보는 오른편 산을 백호라고 한다. 한양의 우백호는 인왕산이다. “인왕산 모르는 호랑이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왕산에는 호랑이가 많았다. 태종 10년(1405) 7월25일, “밤에 호랑이가 근정전 뜰에 들어왔다”. 왕조실록 기록이다. 풍수에서 백호는 명당터를 보고 순하게 쭈그려 앉은 모양새가 좋다고 보았고, 왼편의 청룡에 비해서 지나치게 크거나 높으면 좋지 않다고 해석했다. 왜 백호일까? 원래 백호는 동아시아 천문도에서 서쪽을 관장하는 별자리로, 사신(四神)의 하나였다. 장소지킴이의 수호별이었다. 별 백호가 풍수사상과 결합하여 산 백호로 확장된 것이다.
서울 시흥동 호암산의 거친 기세. 호랑이가 뛰어 내리려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다. 왼편이 머리, 오른편으로 어깻죽지·등·허벅지가 이어진다
■ 풍수에 호랑이산…‘명당터’의 상징으로
전형적인 풍수 명당의 하나로 호랑이 형국도 생겨났다. ‘사나운 호랑이가 숲에서 나오는 형국(맹호출림형)’이 대표적이다. 경기 이천 백사면에 호암산이라고 있다. 능선에 호랑이 형상으로 생긴 바위가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산으로 인해 예로부터 명인이 많이 태어났다고 믿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혈을 자르려고 말뚝을 박고, 호랑이 눈 부위의 돌을 뽑아 제방을 쌓았다. 그 후로 명인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전국 어디나 있는 단맥(斷脈) 설화다. 그 호암산에는 호암사(虎巖寺)라는 옛 절이 있었다.
가뜩이나 호랑이가 무서운 판에 호랑이처럼 사나운 산이 있어 위협적으로 보일 때는 제압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는 호압사(虎壓寺)라는 재미난 이름의 절이 있다. 호랑이를 제압하는 절이라는 뜻이다. 왜 이런 절이 세워졌을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관련 기록이 있다. “호암산은 우뚝한 형세가 범이 가는 것 같고, 또 험하고 위태한 바위가 있는데 호암이라 부른다. 북쪽에 궁교(弓橋)와 사자암(獅子庵)이 있는데 모두 범이 가는 듯한 산세를 누르려는 것이다.” <시흥군읍지>(1899)에는 동화 같은 돌개(石狗) 이야기도 나온다. “산이 호랑이가 걸터앉은 듯하다. 한양에 도읍을 정했을 때 돌로 만든 개 4마리로 지키도록 했다.”
조선 건국 초의 일이었다. 태조는 만년의 사직을 위해 궁궐을 짓는데 이상하게도 허물어져 내리는 일이 반복되었다. 목수들을 불러서 그 까닭을 물었다. 대답인즉 밤마다 호랑이가 달려드는 꿈에 시달리는데, 반은 호랑이고 반은 형체도 알 수 없는 괴물이 궁궐을 부순다는 것이었다. 고민하던 어느 날 홀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한 노인이 꿈에 나타났다. “저기 한강 남쪽에 있는 산봉우리를 보시오.” 호암산이었다. 이성계는 비로소 궁궐이 무너져 내린 까닭을 알아차렸다. 즉시 저 산봉우리의 기세를 누를 방도를 물었다. 노인은 대답했다. “호랑이는 본시 꼬리를 밟히면 꼼짝하지 못하는 짐승이오. 그 꼬리 부분에 절을 지으면 만사가 순조로우리라” 하고는 사라졌다. 놀라 잠을 깬 이성계는 당장 그곳에 절을 지었는데 그 절이 호압사이고 노인은 무학대사란다.
호압사는 호암산의 꼬리 부분을 마주하고 입지했다. 사자암도 현재 상도동에 있다. 사자로 호랑이를 경계하려는 뜻이다. 활의 역할을 하는 궁교도, 호암산에 남아 있는 돌개도 호랑이산을 견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호암산에 대한 삼중 사중의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김해의 임호산(179m)에 얽힌 이야기도 흥미롭다. 산이 고을을 바라보며 앉은 호랑이 모습을 하였다. 김해 사람들은 호랑이산의 기운이 고을에 해나 끼치지 않을까 늘 걱정이었다. 어떻게 방비했을까? 절을 들여세웠다. 그것도 호랑이 입 부위에다. 부처님의 위력과 자비로 산호랑이가 다스려질 것이라는 굳은 믿음과 함께. 지금도 흥부암(興府庵)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 민속놀이·풍수·설화 곳곳 호랑이와 결합
호랑이산으로 인한 민속놀이도 생겨났다. 전남 영암 도포리의 도포제 줄다리기다. 150여년의 내력이 있는데 음력 정월 5일과 칠월 칠석에 행해진다. 유래가 재미있다. 마을 주위로 서쪽은 사자산, 북쪽은 호산(虎山)이 있는데 마을산은 돼지산이고 마을터는 돼지형국이란다. 맹수가 언제 덮칠지 모르는 불안한 입지 형세인 것이다. 마을사람들은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했을까? 돼지산에 천제단을 모시고 하늘제사를 올린 뒤 무사가 호랑이산과 사자산을 겨냥해 화살을 쏘는 주술 의식을 한다. 이어서 줄다리기를 한다.
이처럼 한국 사람들에게 호랑이와 호랑이산은 풍수, 민속, 종교, 설화, 놀이와 의례 등과 결합된 복합적인 문화코드의 생활사였다. 근대에는 국토 모양을 호랑이로 본 일도 유명하다. 일제강점기 때 고토분지로(小藤文次郞)가 한반도의 형상을 토끼로 비유하자 최남선이 발끈하여 호랑이지도로 그렸다. “무한한 포부와 용기로써 아시아 대륙과 세계에 웅비하려는 맹호”라고 했다. 호랑이산 코드가 호랑이한반도로 버전업된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