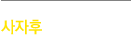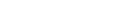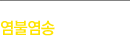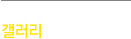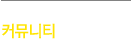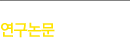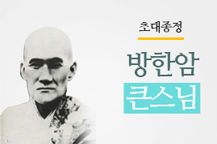우리 산(山)의 인문학 – 비봉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 관리자 작성일14-12-10 15:46 조회5,086회 댓글0건본문
우리 산(山)의 인문학 – 비봉산
ㆍ사람도 타고나는 법이여
춘향가 한 대목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산세 따라서 사람도 타고나는 법이여.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하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矗:삐죽)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 있고, 충청도 산세는 순순(順順)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로 올라 한양터 보면 자른 목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사람이 나면 선할 땐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성(別惡之性)이라.”
이 사설은 산세를 타고 사람이 나고, 산세에 따라 지역적인 인성도 달리 형성된다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잘 드러내준다. 한 가마 속의 도자기가 비슷하게 구워지듯이 같은 공간과 환경 속에서 비슷한 문화와 인성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녕 산이 사람을 만드는 것일까?
비봉산(飛鳳山)이라고 있다.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주로 지방도시의 진산이었다. 조선시대 250여개 지방 진산 중에서 가장 많은 산 이름이 비봉산이다. 충청도 제천, 경상도 선산•진주•봉화•의성, 강원도 양구•정선, 경기도 안성•화성•안양, 전라도 완주•고흥•화순에도 있다. 전국에 봉황과 관련한 산과 마을지명은 134개에 이른다는 한 연구결과도 있다. 봉황이 나타나면 태평성대를 이루고 비봉산 아래에는 인물이 난다는 믿음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다. 정말 비봉산 아래의 고을은 번영을 보장받고 귀한 인물이 나는 것일까?
비봉산은 봉황산 계열의 산이다. 한국의 산에서 봉황산은 용산과 함께 대표적인 산 이름 유형이다. 일반명칭으로 봉산 혹은 봉황산이고 신체 부위를 따서 봉두산(鳳頭山), 봉미산(鳳尾山)이라고도 했다. 자태로 보아 날아간다 비봉산(飛鳳山), 춤춘다 무봉산(舞鳳山), 운다 봉명산(鳳鳴山), 머문다 유봉산(留鳳山), 의젓하다 봉의산(鳳儀山), 위엄있다 위봉산(威鳳山)이라고도 했다. 산 모양은 새가 날개를 펼친 듯 가로로 길
쭉하거나 날개를 접고 서있는 듯 세로로 우뚝한 등 다양하다.

진주 비봉산. 시가지 뒤로 봉황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남강과 진주성 촉석루도 보인다. | 최원석 교수 제공
■ 산이란 대상을 ‘보는 행위’를 통해 문화로
빙산의 일각처럼 의식도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거대한 무의식의 영역이 전개된다. 산이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다가오는지 김광섭 시인(1905-1977)은 이렇게 심상적으로 표현했다. “이상하게도 내가 사는 데서는, 새벽녘이면 산들이,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 날아와서는, 종일토록 먹도 않고 말도 않고 엎댔다가는, 틀만 남겨 놓고 먼 산 속으로 간다.” 산이 새의 이미지로 날개를 펴고 날아와서 마음에 틀을 남기고 가는 존재로 형상화된 것이다.
이렇듯 산을 그 자체가 아니라 대상의 이미지로 보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한다.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일화로 이해하면 쉽다. “대사의 얼굴은 돼지 같구려.” “전하의 용안은 부처님 같으십니다.” “어찌 그렇게 보시는가?”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지요.” 그것이 투사다. 우리 속담에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는 말이 그것이다.
산이라는 객관적인 대상이 있지만 그것이 보는 행위를 통해 인식될 때는 사람과 문화에 따라 주관적이고 상대적으로 보인다. 산이 텍스트로 읽혀지는 것이다. 대상을 보는 행위의 주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눈이라는 감각기관과 뇌라는 인지기관을 통하는 사이에 문화라는 매개를 거쳐 받아들이는 것이다.
옛사람들의 비봉산 인식은 풍수적•심리적•사회적•경관적 필터가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다. 풍수적으로 산은 봉황이라는 형국과 기운을 띤 유기체적인 대상으로 인지된다. 그 산에는 어김없이 비봉귀소형(날아가는 봉황이 둥지에 깃든 형국) 등의 봉황 명당이 있다. 심리적으로 봉황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산에 투사되어 동일시되는 과정을 거친다. 사회적으로 비봉산이 진산(鎭山)으로 공식화되면서 향촌공동체 사이에 공유지식이 되고 태도의 합의가 형성된다. 경관적으로 대나무 숲 등과 같은 봉황산과 관련된 파생경관이 형성되어 실체로서 공고해지는 메커니즘이 형성된다. 이 모두를 한마디로 비봉산 문화생태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요즘엔 생태라는 말도 진화하여 자연생태, 인간생태, 사회생태에다 인터넷생태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런데 온라인과 같은 가상의 생태는 예전에도 있었다. 봉황 생태가 그것이다. 봉황은 존재하지도 않은 상상의 새다. 그런데 “봉황은 벽오동 나무가 아니면 깃들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고, 예천(단샘)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고 했다. 마치 봉황이 실제의 새인 양 천연스레 말하는 <장자> 이야기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봉황의 생태를 확고히 믿었다.
■ 상상 속 봉황에 대한 옛 사람들의 믿음
“전남 화순에 수많은 새들이 모여 살았던 산이 있었다. 새들은 신령스러워 나라에 변란이 있을 땐 요란스럽게 울었다. 소음을 참다못한 한 농부가 숲에 불을 질러 버렸다. 불길은 세찬 바람을 타고 온 산을 감쌌고 새들은 모조리 타 죽고 말았다. 그런데 잿더미로 변한 산 위에서 암(봉)황새 한 마리가 구슬프게 울다가 수(봉)황새의 옆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다. 사람들은 새의 넋을 불쌍히 여겨 함께 묻어주었다. 그 후로부터 이 산을 비봉산이라 했다. 능성고을은 예부터 부자 고을로 이름 높았고 인물도 많이 배출된 고장이었다. 그러나 새들이 모조리 불에 타 죽은 뒤부터 재앙이 끊이지 않고 전염병도 만연했다. 이듬해엔 홍수도 덮쳐 수백 명이 죽었다.” 이 설화 속의 비봉산은 조류 생태계가 풍부한 산임을 알 수 있다. 일시에 생태계가 파괴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이 닥친다는 것을 경계하는 교훈적인 자연생태 설화다.
봉황은 용과 함께 각각 날짐승과 길짐승을 대표하는 신성한 상징물이다. 용, 거북, 기린과 함께 네 가지의 영물이다. 봉황은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날아오기에 덕치(德治)와 태평성대의 상징이기도 했다. <순자>에 “예부터 임금의 다스림이 살림을 좋아하고 죽임을 미워하면 봉황이 나무에 줄지어 나타난다”라고 했다. 봉황의 사회생태다. 지방 고을의 대표적 진산으로 봉황산(비봉산)을 선호한 것은 이런 정치사회적 이유 때문이었다.

왼쪽 지도는 진주 비봉산. 고을을 둥글게 에워싸고 있다. 진주성과 남강도 보인다. (해동지도, 규장각 소장) 오른쪽 지도는 순흥 비봉산. 풍수 산도를 연상하는 산줄기 묘사 기법이 인상적이다. (1872년 군현지도, 규장각 소장)
■ 봉황의 생태를 따라 파생된 산이름들
봉황 생태로 인해 파생된 산(이름)도 줄줄이 생겼다. 봉황은 대나무를 좋아한다고 하여 죽방산(竹防山)이라 했고, 까치가 울면 잡으려 봉황새가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 못한다고 하여 까치산(鵲山)을 두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이야기다. 오동나무에 깃든다고 오산(梧山), 대나무열매를 먹고 산다고 죽실산(竹實山), 봉실산(鳳實山)도 생겼다. 그래서 봉황산을 진산으로 둔 여러 고을과 마을에서는 대나무 숲을 조성했다. 한술 더 떠서 봉황알도 만들었다. 경북 선산에는 오란산(五卵山)이라고 있었다. 봉황의 다섯 알을 상징한 조산이다. 봉황이 날아와 알을 하나씩 낳을 때마다 인물이 한 명씩 난다고 믿었다. 고장을 부흥할 만한 큰 인물을 기대하는 심리의식이었다. 봉황알은 지역에 따라 난산(卵山), 난함산(卵含山)이라고도 불렀다. 봉황산으로 인해 봉산동, 봉죽동 등 수많은 봉자 돌림 마을지명도 숱하게 생겼다.
■ 봉황은 바람… 기운 넘치는 태평성대의 꿈
진주의 비봉산은 도심 북쪽에 시내를 에워싸고 있는 162m의 나지막한 산이다. 마치 봉황이 날개를 크게 펼친 듯 모양을 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풍수사상의 성행으로 비봉산을 재해석하게 되면서 고을경관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진주는 진산이 비봉형이라 사방의 배치는 모두 봉(鳳)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다. 객사 앞에는 봉명루(鳳鳴樓)가 있고 마을 이름으로 죽동(竹洞)이 있다. 벌로수와 옥현에 대나무를 심었는데 죽실(竹實)은 봉이 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산 이름을 망진(網鎭)이라고 한 것은 봉이 그물을 보면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들에 작평(鵲坪)이 있는 것은 봉이 까치를 보면 날지 못하기 때문이다.” <진양지>(1633)에 나오는 비봉산 문화생태 이야기다.
왜 하필 비봉인가? 봉황이란 어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근원으로 바람에 이른다. 봉(鳳)은 갑골문에서 바람(風)과 같이 통용됐다고 한다. 봉새(鳳鳥)는 바람신(風神)으로 나온다. <금경(禽經)>에도 “봉은 날짐승으로 매류이다. 풍백(風伯)이라고 말한다. 비상하면 하늘에 큰바람이 인다”고 했다. 그렇다면 비봉은 하늘로 날아오르려 날개를 펼치는 활기찬 바람이다. 비봉산은 형상화된 봉황의 날갯짓이다. 비봉산으로 인해 고장의 주민들은 집단공동체적으로 고무되고 고취되는 것이다.
흥미로운 건 우리말 바람이 함축하고 있는 다중적인 의미다. 바람난다, 바람 맞았다, 바람 잡다, 바람 들다, 모두 바람이다. 이 바람은 외적인 공기의 흐름이 아니라 내적인 기운의 움직임이다. 그 바람은 마음과 몸, 너와 나, 사람과 산에도 있다. “나를 키운 건 8할이 바람이다.” 서정주 시인의 바람이다. 비봉산을 진산으로 둔 고을 주민들이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고을을 키운 건 8할이 비봉산이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비봉산을 곁에 둠으로써 봉황 같은 인물을 염원하고 자손이 융성하며 봉황이 머무는 태평한 고장을 만들려 했다. 그 비봉산은 주민들에게 우러르고 닮을 산으로서 상징화된 산천에너지요, 형상화된 산천무의식이었다.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 나는 천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세월호 추모곡이다. 역사의 바람이 된 아이들아, 우리 산하의 봉황으로 깃들어 자유롭게 날거라. 천년에도 꺼지지 않는 바람의 산이 되어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