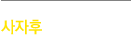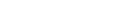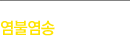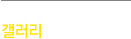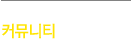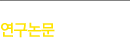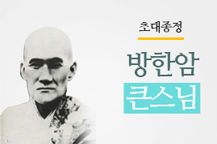산(山)의 인문학 - 덕유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 관리자 작성일14-10-21 03:04 조회6,379회 댓글0건본문
산(山)의 인문학 - 덕유산
ㆍ산은 덕을 베풀고, 사람은 덕을 쌓고
그 이름처럼 덕스럽고 넉넉한 덕유산(德裕山)은 우리 심성 깊숙이 자리 잡은 아련한 고향과도 같은 산이다. 모진
세상살이 다 겪고 소소한 마음으로 돌아온 이 누구든, 맑은 개울가 양지녘 산자락에 에워싸여 둥지를 틀고
싶은 그런 산이다.
선조들은 덕목을 참 좋아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덕산 이름은 전국 어디나 있다. 건덕산, 용덕산, 수덕산, 덕숭산, 숭덕산, 고덕산, 천덕산, 가덕산, 공덕산, 광덕산, 백덕산, 만덕산, 세덕산 등 모두 덕을 기리는 산이름들이다. 이들 한국의 산 이름을 도서관 서가처럼 분류하면
각각 어디에 자리할까? 영축산은 불교명이니 종교코너, 남산은 위치명이니 지리코너일 텐데 덕산은 품성이
투영된 이름이라 인문서가의 윤리코너에 진열될 수 있겠다. 이렇듯 우리에게 산이름은 또 하나의 문화적인 텍스트다.
왜 산을 덕스럽다고 불렀을까? 노자는 <도덕경>에서 물의 덕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럼 산의
덕은 무언가. 선현들은 “덕이 만물을 기르고 윤택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바로 산의 덕성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다. 한나라 때
최초의 자전 <설문해자>에서도 ‘산’을 풀이하기를, “산은
베푼다. 기를 베풀고 퍼지게 해 만물을 살린다”고 했으니
덕유산은 뭇 생명을 살리는 산의 본성을 오롯이 담고 있는 이름이 아니고 무엇인가.

전란도 피해가는 넉넉한 육산, 북덕유 북덕유의 넉넉하고 덕스러운 품새.

의인들 본거지된 장쾌한 골산, 남덕유 남덕유의 장쾌하고 힘찬 골기.
■ 덕은 도를 행해 체득한 인격의 으뜸
동아시아에서 덕은 도를 행해 체득한 품성으로 인격에서 으뜸으로 여기는 가치다. 지도자도 덕장을 지장, 용장보다 더 높이 치는 것처럼 덕유산은 산이름에서도
높은 격을 지닌 덕장의 산이요, 덕망 높은 이름임에 분명하다. 덕유산
곁 동쪽에는 대덕산(大德山·1290m)도 있어 그 일대가
온통 덕스러운 산들이다. 덕유산에서 맥을 받고 뻗어 내린 지리산도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덕산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렀으니, 덕유산은 한국 덕산의 종마루라고 할 만하다.
덕유산이 사람들에게 베푼 덕을 기리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다. 임진왜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 들어왔는데 신기하게도 왜군들이 지날 때마다 짙은 안개가 드리워 산속에 숨었던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는 것이다. 이 설화는 주민들이 덕유산을 얼마나 사람 살리는 신령한 산으로 존숭하였는지 잘 말해준다. 이런 까닭에 덕유산 자락은 전란이 미치지 않는 십승지(十勝地)의 하나로 꼽혔다. 조선후기 민중의 바이블이었던 <정감록>에서도 “덕유산은
난리를 피하지 못할 곳이 없다”고 일렀다.
덕유산의 덕스러움은 산체의 형태에서도 나타난다. 두꺼운 토산으로, 능선부 곳곳엔 여인의 둔부처럼 펑퍼짐한 평전이 있다. 덕유산을 남덕유와
북덕유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남덕유는 장쾌하고 힘찬 골산(骨山)이지만 북덕유는 넉넉하고 웅장한 육산(肉山)이다. 후덕한 육산은 주민들에게 비옥한 농경지를 제공한다. 그래서 덕유산은 사람들에게 넉넉히 베풀어주는 산으로 여겨졌다. 이중환도
북덕유 자락(무풍)을 ‘복된
땅’(福地)이라 하면서 “골
바깥쪽은 온 산에 밭이 기름져서 넉넉하게 사는 마을이 많으니 속리산 이북의 산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고 풍요로운 자연조건을 높이 샀다.
■ 3개 도·5개 군에 걸친 삼도의 분수령
덕유산이 갖춘 덕은 지정학적·지리적 위치에서도 드러난다.
<중용>에 “큰 덕은 반드시 그 지위를
갖춘다”고 했듯이 덕유산은 한반도에서 삼도를 가르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여 행정 경계를 결정짓는 유역권의
분수령을 이룬다. 전북 무주와 장수, 경남 거창과 함양, 그리고 충북 영동 등 3개 도,
5개 군에 걸쳐 있다. 지정학적인 위치의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신라, 가야, 백제의 접경지가 되었으니 그 대표적인 역사경관이 덕유산 북쪽에 있는 신라와 백제의 관문인 나제통문이다.
지리적으로도 덕유산은 백두대간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 산줄기로는 위로 삼도봉과 아래로 백운산을
거쳐 지리산과 연결해 준다. 물줄기로는 낙동강 지류인 황강과 남강의 발원지일 뿐 아니라, 낙동강 수계와 금강 수계의 분수령을
이룬다. 남한에서 한라, 지리, 설악에 이어서 네 번째로 높은 해발 1614m의 향적봉을 주봉으로, 덕유산의 넉넉한 줄기는 삼봉산에서 향적봉을 거쳐 남덕유까지 줄기차게 100리길로
이어진다. <대동여지도>를 보면 조선시대에 덕유산은
향적봉의 북덕유를 일컫는 것이었고, 남덕유는 봉황봉이었음도 새롭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 산을 닮아 ‘지·인·용’ 갖춘 선비들 은둔
덕유산은 숨은 미덕을 지닌 산이기도 하다. 지리산에 가려 조선시대에 와서야 명산으로서 가치가
알려졌다. 덕은 외롭지 않고 밖으로 드러나듯이 덕유산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 허목(1595~1682)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덕유산기>에
적기를 “남쪽 지방의 명산은 절정을 이루는데 덕유산이 가장 기이하다”고
찬탄했다. 성해응도 <동국명산기>에 덕유산을 포함시키고 “서북쪽 산록의 골짜기가 매우 기이하다”고 했다. 조선후기에 덕유산이 갖는 백두대간의 지리적 위치가 주목되면서
이중환은 <동국산수록>에 덕유산을 국토의 등줄기에
있는 8명산 중 하나에 넣기도 했다. 이런 덕유산을 함양, 산청, 진주 등의 인근 고을들은 읍치의 진산이 발원하는 산줄기의 근본으로 삼았다.
후하게 베푼다고만 해서 덕의 온전함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까? <중용>에 덕은 지혜(智)와
어짊(仁)과 용기(勇) 세 가지 필요충분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슬기로울 때는 슬기로워야
하고 어질 때는 어질어야 하며 용기가 필요할 때는 의로워야 하는 것이다. 덕유산에 살면서 덕유산을 닮았던
사람들이 그랬다. 민중들은 산림에 묻혀 묵묵히 어질게 살면서도 때가 되면 우레처럼 소리쳐 일어났다.
덕유산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시기는 일찍이 선사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덕유 자락인 거창군
북상면 농산리에는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도 발견된 바 있다. 늦어도 청동기 시기에는 집단적인 주거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기에는 여러 불교 사찰도 덕유산 자락 곳곳에 들어섰다. 송계사, 영각사 등이 그랬고 농산리의 석조여래입상, 갈계리의 삼층석탑 등의
신라시대 유적들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
덕유산이 본격적인 사람의 산이 된 것은 조선시대였다. 많은 사람들이 임진왜란을 피해서 덕유산에
들어왔고 골짜기마다 마을이 형성됐다. 지식인들도 덕유산을 찾아 은거하여 곳곳에서 올곧은 선비의 기상을
드리웠다. 그래서 덕유산은 유학자들의 은거지요, 은사(隱士)의 산이라고 할 만 하다. 유환, 임훈, 정온, 신권, 송준길 등 수많은 유학자들이 덕유산에서 덕을 수양했다. 골짜기엔
이르는 곳마다 선비들의 정자나 초당이 들어섰으니 거창에는 누정만도 100여개가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군자는 숨고(藏焉) 닦고(修焉) 쉬며(息焉) 노닌다(遊焉)(<예기>)”는 뜻을 덕유산에서 몸소 실천하며 살았다.
그 시작은 고려 말의 은사 유환이었다. 왕조가 망하자 그는 덕유산 남쪽 거창군 장기리 창마에
내려와 정자를 짓고 은거하였다. 조선시대의 유학자들도 뒤를 이었다. 신권은
중종 때의 성리학자로 위천면 수승대에서 안빈낙도하며 수신하였다. 정온은 인조를 따라 남한산성에 들어가 끝까지 싸우기를 주장하고 할복자결까지 시도한 분으로, 남덕유
북상면 모리에 은거하며 후학들을 가르쳤다. 송준길은 학문에 뛰어나서 문묘에 배향되었는데 병자호란 뒤에
월성에 와서 초당을 짓고 살았다.
■ 농민 항쟁·항일 투쟁… 변혁의
산실로
조선후기에 전란과 학정으로 피폐하였던 민중들은 승지와 복지로 알려진 덕유산을 터전으로 삼아 피란, 보신(保身)의 삶을 일구어 나갔다. 덕유산의
승지가 어디인지는 <정감록>에 설명이 있다. 북덕유 승지는 “무주 무풍 북쪽 동굴 옆의 음지”라고 했다. 무풍(무주군
무풍면)은 덕유산과 삼도봉 자락에 둘러싸이고 큰 하천을 낀 분지이면서도 조선시대의 대로와 멀리 떨어진 지리적인 오지다. 남덕유
승지는 “덕유산 남쪽에 원학동이 있는데 숨어 살 만한 곳”이라고
했다. 덕유산 남쪽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거창 금원산과 남덕유 사이의 골짜기일 가능성이 크다.
덕유산은 조선후기부터 해방 전후에 걸쳐 지식인과 민중들이 새 세상을 여는 변혁의 산실이기도 했다. 농민항쟁과
동학혁명, 항일의병과 독립운동으로 이어졌고 한국전쟁 전후에는 빨치산의 주요 근거지였다. 산은 민중운동의 보루였다. 덕유산의 민중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자주권을 되찾으려는 농민들의 항쟁과 항일 투쟁이다. “1671년
11월, 이광성 등이 덕유산에 진을 치고 웅거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농민항쟁의 사실이다. 1906년에는 남덕유 월성에서
의병운동이 일어났다. 40여명이 항일의거를 결의하고 산중에서 활동했으며 덕유산 의병 200여명에게 자금과 군수물자도 조달했다. 1908년 7월11일자 일본 헌병대의 보고서도 덕유산에 약 40명의 의병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이렇듯 덕유산은 사람들을 넉넉히 품어 살리고 늘 푸른 정신을 일깨운 산이었다. 사람들은
그 산에 깃들어 어질고도 주인 되는 의로운 삶을 살아왔다. 산은 덕을 베풀고 사람은 덕을 쌓아 마침내
덕산의 휴머니티를 이루었던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