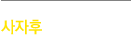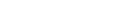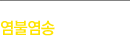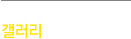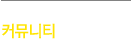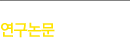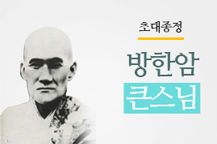산(山)의 인문학 - 태봉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 관리자 작성일14-10-09 06:58 조회6,629회 댓글0건본문
ㆍ어미와 자식 이어주던 ‘태’ 묻힌 산을
‘엄마의 품’ 삼아 살아간다
속리산에서 법주사를 지나 문장대로 가는 산길 오른편에 순조태실이라는 이정표가 있다. 순조(1790~1834)의 태를 묻은 곳이다. 서울 서초구 대모산에 있는 순조의 능(인릉)은 관심을 가져도 태실은 모르고 지나친다. 개울을 건너 소로 따라 10여분쯤 자그마한 봉우리를 올라가면 꼭대기에 태실이 있다. 1790년에 조성한 조선왕실의 태실유적이다. 태실지에서 보면 빙 두른 속리산 능선의 경치가 장관이다. 태는 예전에 중요하게 취급했는데 요즘 새삼 효능이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제대(탯줄)혈의 보관 현황(2012년)을 조사해 보니 37만명이 넘어섰다고 한다.
■ 태는 생명의 기반… 길흉 좌우한다고 믿어
전통적으로 태는 어미와 자식을 이어주는 매개로써 새 생명의 기반으로 여겨 매우 정성껏 다루었다. 태가 어디에 묻히는지에 따라 인생의 길흉을 좌우한다고까지 해서 사대부나 왕실에서는 좋은 터를 골라서 소중히 안장했다. 왕세자의 태는 왕조와 국운까지 영향을 준다고 믿어 엄정한 절차에 의해 태실이 조성되었고, 왕으로 등극하면 태실은 가봉되거나 새로 길지를 선택해 묻기도 했다.
태를 묻은 산을 일러 태봉산이라 했다. 요즘의 태(제대혈) 보관소인 셈이다. 태봉산은 좁은 의미로는 왕실의 태를 묻은 산이지만, 민간에서 태를 묻은 산도 넓은 의미로 태봉산이다. 지도에 오르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 전국에 수백개는 훌쩍 넘어설 것이다(조선왕실 태봉만 300여곳으로 집계한 연구도 있다). 태봉이 있어서 태봉마을, 태봉동, 태봉리라고 붙은 지명도 흔하고 태봉초등학교라는 이름도 여럿 있다. 모두 태봉 돌림 지명이다.
경기 광주의 태전동에도 알처럼 봉긋한 산봉우리가 있다. 성종(1457~1494)의 태실이 있었던 태봉산이다. 태봉산에 접한 마을은 지금도 태봉마을이라고 부른다. 태실은 태봉 꼭대기에 조성됐으나 현재 창경궁에 옮겨 복원하였다. 조선왕실의 태봉 대부분은 평지에 돌출하여 젖무덤처럼 생긴 봉우리 형태를 하고 있다. 태를 묻는 태실은 봉우리 정상의 젖꼭지 부위에 자리한다. 태를 산봉우리에 묻게 된 것은 풍수사상의 영향이 컸다. 돌혈(突穴) 산의 명당에 묻는 것이다.
민간에서는 태를 꼭 산에만 묻는 것은 아니었다. 지역에 따라서도 달랐다. “한 밭머리에 태를 묻었다”는 북한 지역 속담이 있다. 한 동네의 친한 사이를 비유하는 말인데 태를 밭머리에 매장했던 사실을 일러준다. 일반인들은 태를 어디에, 어떻게 처리했을까? 태를 불로 태운 후에 강물에 띄워 보내거나 산 혹은 땅에 묻었다. 정화해서 자연으로 되돌린다는 의미일 것이다. 태우지 않고 그대로 산이나 땅에 묻거나, 바다나 강물에 띄워 보내기도 했다. 산간지역에서는 산에 묻었고 해안이나 강가에서는 물에 띄웠다. 제주도에서도 중산간에서는 산에 묻었지만 해안가에서는 바다에 띄웠다.
일본인들은 어땠을까? 옛 유구(오키나와) 사람들은 산모가 태반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놀랄 일이 아니다. 포유류는 어미가 태를 본능적으로 먹는다. 영양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일본 서민들도 태를 강과 바다에 띄우거나 땅에 묻는 것은 우리와 같다. 다만 천왕가에서는 이나리산(稻荷山), 가모산(賀茂山), 요시다산(吉田山) 등 특정 산에 묻었다. 높고 신성한 공간에 태를 두고자 한 심리로 이해된다.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에서도 아이가 고관대작이 되려면 태를 높은 언덕이나 산에 묻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풍수사상이 미친 영향으로 보인다. 민간에서 한국사람들은 태를 주로 태웠지만 일본사람들이 태워 처리한 것은 비교적 근대의 일이었다.
조선전기에 이문건(1494~1567)이 쓴 <양아록>이라는 육아일기에는, 당시 양반들이 어떻게 태를 태봉산에 묻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다. “태를 냇가에 깨끗이 씻어 기름종이로 싼 뒤 태운다. 나흘째 되는 날 북산(태봉)에 묻는다.” 왜 북산일까? 북쪽은 오행의 수(水)로 생명의 근원이다. 사람이 죽어서 간다는 북망산도 북쪽을 가리킨다. <성종실록>에는 “보통사람은 반드시 가산(家山)에 태를 묻는다고 왕대비가 말씀하시더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사대부마을에서는 태봉산을 정해 태를 묻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웬만한 마을마다 태봉산이 있었던 셈이다.
■ 삼국사기에 김유신의 ‘태’도 묻었다는 기록
한국에서 태를 산에뭍는 는 매우 오래됐다. “김유신(595~673)의 아버지가 유신의 태를 고을(경기도 진천) 남쪽 15리에 안장해 태령산(胎靈山)이라 불렀다”는 <삼국사기> 의 옛 기록이 있다.
고려 충렬왕 때 세자의 태를 안동부에 안장했다는 기록도 <고려사>에 나온다. 고려와 조선에 걸쳐 왕조에서는 전담부서까지 두고 풍수전문가가 명당터를 골랐으며, 신중히 택일하여 태실을 조성하고, 사후에 철저하게 보호 관리하였다.
한국의 왕실 문화 에서 탄생(태실지)-삶(궁궐)-죽음(왕릉)으로 이어지는 일생동안의 풍수사상이 전반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동아시아에서도 특이한 문화현상이다. 중국만 하더라도 풍수문화가 태실까지는 크게 미치지 못했고 일본은 가옥배치(家相) 정도로 영향을 주는데 그쳤다.
조선왕실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의 태는 출생 후 5개월, 여자의 태는 3개월째 되던 날에 묻는 것이 관례였다. 태실 후보지는 세 곳을 추천받아 왕이 최종 결정하였다. 낙점 후 택일하여 정해진 의식과 절차에 의해 태실을 조성했다. 태봉산에는 금표를 두고 소나무 채취, 경작을 금지하는 등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태실은 도면과 문서로도 남겼다. ‘태봉산도’로 실제 모습을 상세히 그렸고 <태봉의궤>로 조성·보수·관리 사실을 철저히 기록하여 왕실기록유산으로 전했다.
장조(사도세자) 태봉도(1785). 장서각 소장
■ 일제에 의해 강제로 옮겨진 조선왕조 태실
조선왕조의 태실은 대부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분포돼 있다. 성종대 이후로는 경기도와 강원도에도 태실을 조성했고 황해도 지역에도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이들 태실 유적은 모두 파헤쳐 강제로 옮겨지면서 원형을 잃었다. 일제는 1929년에 태실 54기를 경기도 고양의 서삼릉 구석에 공원묘지처럼 집단으로 모아두었다. 태실명당에 눈독을 들이고 있던 지역 권력자와 친일파들은 이때다 싶어 자기네 선조의 묘를 그 자리에 썼다. 그래서 조선왕실의 태봉 유적지에 가보면 대부분 텅 비어 있거나 사묘가 들어서 있다.
근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태실 유적을 복원하는 분위기지만, 아직도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태실도 있고, 개발로 훼손된 유적지도 여러 곳이다. 인조 태봉은 충주댐으로 수몰되었고, 현종 태봉은 태실이 있던 산봉우리가 깎여나갔으며, 순종 태봉은 공장지가 되면서 형체도 없어졌다. 태실은 옮겨서 복원해도 되는 석조물만의 유적이 아니다. 태봉산의 제자리에 있을 때 태실로서 온전한 것이다. 우리 문화재의 장소적·경관적 가치를 재평가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 ‘생명 근원’인 산에 태를 묻는 건 회귀 의식
왜 선조들은 산에 태를 묻었을까? 전통적으로 우리네 생명은 산의 정기를 타고 나는 것이었다. 산이 생명의 근원이었던 셈이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모태를 산에 묻었으니 왔던 곳으로 되돌리는 회귀 의식의 반영이다. 그리고 산이라는 큰 생명에너지에 접속하여 주인의 생기를 증폭하고자 한 현실적인 뜻도 있다. 사람들이 태를 산에 묻으면서 산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사람과 산의 관계가 새롭게 달라졌다. 태를 묻은 산은 왕조 혹은 마을과 가문의 번성을 염원하는 생명의 산, 모태산이 되었다.
우리는 어미 배 속의 태아처럼 하늘과 땅(산)으로 이루어진 커다란 자궁 속에 잉태되어 공명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형태적으로 그렇다. 어미 배 속의 자궁 이미지를 그려 보라. 태반이 태아를 받치고 있는 모습은 우리네 산이 삶터를 뒷받침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 태반에서 탯줄이 태아에게 연결되듯 뒷산에서 산줄기가 마을과 집으로 연결되었다. 태반과 뒷산, 탯줄과 산줄기가 등치되는 것이다. 기능적으로도 그렇다. 태반이 태아의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물질교환을 매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듯 산은 주민에게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먹을거리를 주며 생활공간을 에워싸서 지킨다. 탯줄이 태아의 생명줄이듯 산줄기는 주민과 생태 의 통로 역할을 한다.
겨레 의식의 골수를 담고 있는 무가(巫歌)에도 “울 엄니 품속 같은 좋은 땅”이라고 나오듯 우리네 삶터의 모형은 모태와 동일하게 상징되어 구상화되었다. 카를 구스타프 융의 개념 틀에 적용해 새로 해석하면, 어미의 배 속과 산의 품속은 원형(Archetype)의 반복이며 그것은 집단적으로 내재해 있는 산천무의식이 삶터에서 재현된 것이었다.
전통적인 지인상관(地人相關)의 사유방식에서 땅은 어머니, 산은 태반, 산줄기는 탯줄, 삶의 둥지는 태 자리였던 것이다. 그것은 산과 몸의 인문학적·현상학적 합일이요, 공진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신산불이(身山不二)’의 경관상이었다. 이런 사상·문화적 풍토에서 산의 아들(古山子) 김정호는 “산등성이는 땅의 살과 뼈이고 하천은 땅의 혈맥”이라는 뜻깊은 말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거기서 태봉산은 신산불이를 표상하는 모태산의 아이콘이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