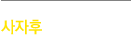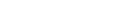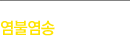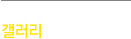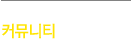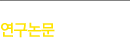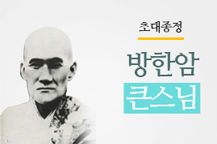포스트 코로나 사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01 20:05 조회3,047회 댓글0건본문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상호작용하지 않으면
일상의 삶 자체가 위기에 처한다는 사실이 비로소 도드라진다.
그제야 일상의 삶이
우리 모두 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구축하고 유지해온
놀라운 공동의 성취로 보인다.
사회학은 일찍이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사회학의 창건자 중 하나인 게오르크 지멜은
대면 상호작용이
아무것도 아닌 텅 빈 물리적 공간을
유의미한 사회적 공간으로 만든다고 설파했다.
대면 상호작용에 들어간 사람들은
서로에게 감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중에서 눈 마주침은
대면 상호작용의 가장 직접적이고 순수한 형식이다.
눈 마주침을 통해
각자 고유한 영혼을 교환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시선의 호혜성이 수립된다.
이 시선의 호혜성이야말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구성하는 근대 사회성의 씨앗이다.
코로나19 이전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나?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혐오 바이러스가 집 밖 세계에 가득했다.
경제적 효율성을 들어
많은 사람을 대면 상호작용도 할 수 없는 소수자로 내몰았다.
계급, 젠더, 지역, 나이, 교육, 몸, 섹슈얼리티 등
온갖 사회적 범주에서
소수자의 자리를 점한 사람이 집 밖에 나가길 두려워했다.
나갔다가는 소수자 혐오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저항하면 혐오 바이러스 보균자로 취급당해 더한 혐오를 뒤집어쓴다.
사정이 이러하니
소수자는 대면 상호작용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가격리하고 자가봉쇄당했다.
다수자조차도 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함께하던 공동 작업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기계와 씨름하게 되었다.
관리와 행정의 편의성을 위해
공공시설의 출입구를 차단하여
오고 가는 사람을 최소화했다.
사회 전체적으로
대면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공간이 쪼그라들었다.
한국이 거리 두기를 잘했다고 다른 나라에서 칭송하는데,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꼭 기뻐할 수만도 없게 된다.
우리 사회가 대면 상호작용 없이도
나름 작동해온 무감각한 기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물론 비대면 상호작용은 키오스크가 보여주듯
일부 사용자에게 효율성과 자유를 가져다준다.
하지만 극단으로 가면 사회 그 자체를 위협한다.
다른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시선을 호혜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포스트 코로나 사회는
누구나 대면 상호작용의 당사자가 되어
시선을 호혜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감각의 공동체여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