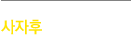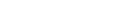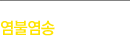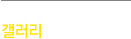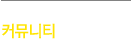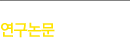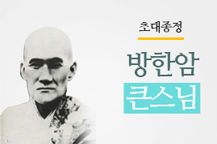공적 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23 09:49 조회1,846회 댓글0건본문
공자는 벗에도 관심이 컸다.
고상한 우정을 환기하는
“금란지교(金蘭之交)”도 출처가 공자이고,
“글로써 벗한다”는 뜻의
“이문회우(以文會友)”(<논어>)도 공자의 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논어>에는 벗에 대한 공자의 언급이 자못 실려 있다.
그만큼 공자는 벗을 중시했다.
왜 그랬을까?
“자신보다 못한 이와는 벗하지 말라!”는
공자의 말은 답을 찾는 데 쏠쏠한 힌트가 된다.
사실 공자의 이 말대로 했다가는
결국 벗을 못 삼게 된다.
벗은 보통 둘 사이에 맺어진다.
갑과 을이 서로를 벗 삼아야
비로소 벗 관계가 성립된다.
짝사랑이란 말이 있는 걸 보면
혼자 하는 사랑은 사랑의 일종으로 여겨진 듯하다.
적어도 공자의 시대까지는
이렇듯 우정을 공적 차원에서 다루었다.
참된 우정의 표본으로 꼽히는 관포지교(管鮑之交)도
그 실질은
관중과 포숙아가 공적 이로움의 실현을 위해 맺은 우정이었다.
사적 우정이 문제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또한 수어지교(水魚之交)도 한가지다
<사기>를 지은 사마천이 앞선 시대와 달리
관포지교를 사적 우정의 표본으로 기술했던 것처럼
사적 우정도 당연히 소중하다.
다만 아무리 소중해도
사적 정리가 공적 영역에 개입하면
공정치 못한 처사임은 분명하다.
검찰 출신이 국가 요직을 꿰차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